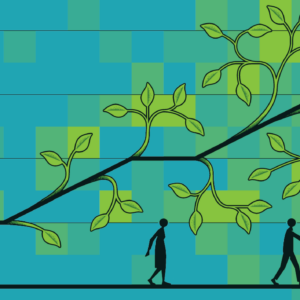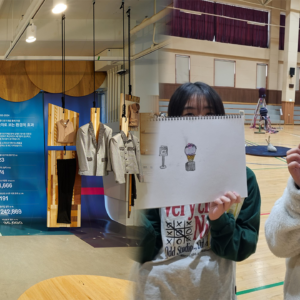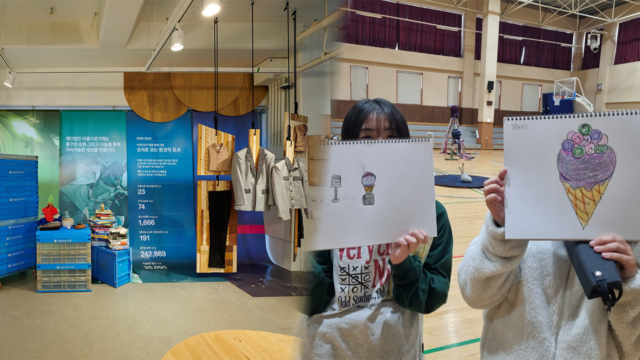[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
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7·끝>
10여 년 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됐다.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한국살이 10년째, 지난 여름 뜻깊은 제안이 찾아왔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이주배경청년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낸 경험이 계기가 됐다. 현장의 문제를 직접 취재해보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나는 ‘더나은미래’의 인턴 기자로 합류했다.
나는 흔히 말하는 ‘이상한 인턴’이었다. 채용 과정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바로 ‘비자’였다. 혹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근무 형태일까 불안했다.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756쪽에 달하는 법무부 ‘비자 매뉴얼’을 직접 뒤졌다. 내 인생의 모든 국면에는 늘 ‘비자’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8월 7일, 면접 당일. 지하철에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펼쳐 들었다. 좋아하던 시의 한 구절을 빌려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겠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장 단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다. 짧은 이동 시간 동안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클래식 음악을 반복해 들었다.
이번 면접은 당락을 가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면접실 문을 열자, 내 자기소개서가 면접관 손에서 넘겨지고 있었다. 긴장이 바짝 올라왔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국에 온 뒤 부딪쳤던 크고 작은 어려움, 낯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8월 13일, 첫 출근길. 시청역은 늘 학교로 향할 때 지나치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도 드디어 ‘출근길 인파’ 속 한 사람이 된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밀리고 부딪히며도 마음은 들떴다. 광화문 돌담길과 빌딩 숲이 낯설 만큼 눈부셨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다. 그날의 폭우를 ‘액땜’이라 믿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상한 인턴’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이주배경청년의 고용 사각지대를 취재하는 일이었다. 자료를 읽을수록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이 ‘닮음’이야말로 구조적 문제가 세대를 넘어 굳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부모 세대는 자녀가 자신과 같은 한계를 겪을까 두려워, 스스로의 삶을 뒤로 미뤘다. 그것이 내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구조의 그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짙게 덮고 있었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취업 상담을 받던 중 들은 말이 있다. “일부 기업은 F-4 비자 지원자를 받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덧붙였다. “그런 기업은 애초에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졌다. 비자 유형이 능력의 잣대가 되는 현실이 서글펐다.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을 찾았다. 8월 19일 첫 인터뷰를 시작으로 6명의 이주배경청년을 만났다. ‘한국 생존기’를 들려주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각성이 뒤섞여 있었다. 당사자인 나로서는 그들의 시간과 감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송연우(26·가명)씨는 말했다. “필요한 걸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끼리의 바람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이 들어줄 거란 기대도 이제는 없어요.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인터뷰이 이아서(26)씨는 “솔직히 우리가 말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같은 이주배경청년들에게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변화에 대한 희망보다, 자신을 다잡는 결의가 먼저였다. 목소리가 닿지 않는 사회에서 그들은 ‘자력갱생’을 택했다.
세대 간의 연대도 느낄 수 있었다. 임수현(23·가명)씨는 “앞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온 우리가 손을 내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1세대가 2세대를 걱정했듯, 2세대도 3세대를 걱정했다. 연대의 무게는 점점 더 진하게 다가왔다.
취재가 끝날 즈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한 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내 한 마디가 그들의 목소리를 울릴 확성기가 되길 바랐다. 편견과 불평등의 그림자 속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그 책임의 무게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상한 인턴’의 기록은 그렇게 남았다. 문제의식에서 행동으로, 체념에서 연대로 이어진 한 사람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 발자취가 모두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
김지영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 이주배경청년 7인의 이야기는 <우리는 N년째 항해중입니다>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