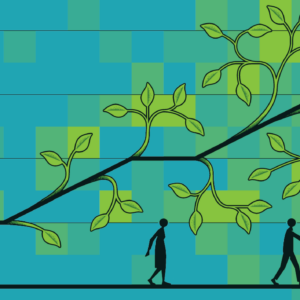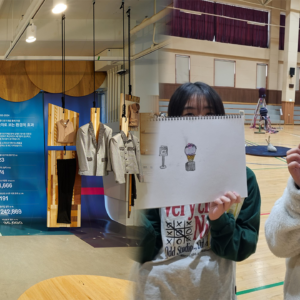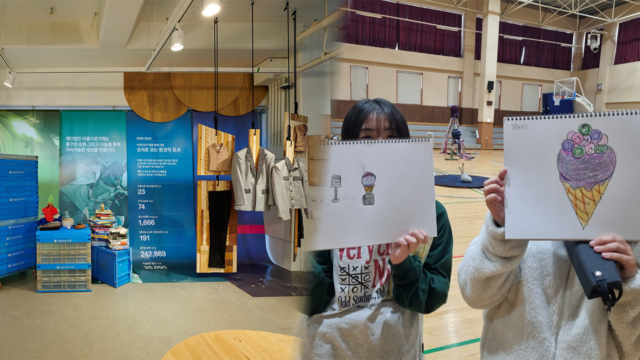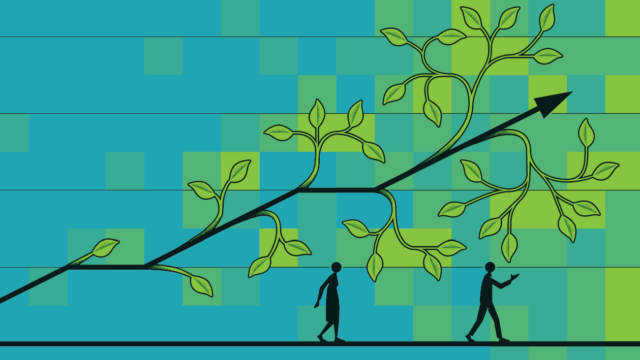“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초기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서늘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님이 그만두시면 회사도 함께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새로운 리더가 갑자기 등장하여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다. 창업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실제로 스타트업 대표자 교체가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대부분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 어떠한 선택이라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다. 회사의 주요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자금 역시 1~2년 이상 버틸 정도로 거뜬하다 해도 자신이 창업하지도 않은 스타트업의 대표직을 수행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을 대표로 모셔오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리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창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미있는 것은 사업을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창업자들도 ‘대표자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종종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즉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그렇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나’ ‘내가 대표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끼는 사업은 그 자체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동시에 대표직의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다. 근래에도 사업의 초기부터 투자로 인연을 맺어온 두 회사를 떠나보냈다. 두 곳 모두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했다. 축하와 송별회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주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은 엉망진창인 창업의 현실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창업자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생사가 걸린 결정의 압박감에서도 매번 뚝심 있는 선택과 실행을 해내었고,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 창업자들의 엉망진창 창업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엄혹한 창업 현실에 대한 경고라 느낄 테고, 누군가는 희망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국내의 유니콘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1조 원으로 인정받는 데에 10여 년이 걸렸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상장에 이르기까지 창업 이후 평균 13년이 소요되었다. 모두가 갈망하는 성과를 내기란 너무나 어렵지만, 그 성과 역시 10여 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다. 성공적인 창업이란 대표를 포함한 공동창업자들의 삶을 불태워야만 가까스로 도달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스타트업계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번 레이트(Burn rate)’라는 말을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
성공적 엑시트를 한 두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에서 몇 차례 돌던 술잔이 다 비워질 때쯤,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대표 모두 두 번째 창업의 길에 섰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흔쾌히 연쇄 창업자가 되곤 한다. 엑시트가 또 다른 시작인 셈이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을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약 없는 버닝은 어김없이 번 아웃으로 이어진다. 창업에 있어서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하지만 엑시트에 대한 논의나 이야기는 아직도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와 같이 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일수록 엑시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10년을 버티지 못하더라도, 유니콘이 되지 못하더라도, 상장기업이 되지 못하더라도 성공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고민이 아닌, 이 회사의 끝이 어때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와 그런 고민을 반기는 문화가 필요하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