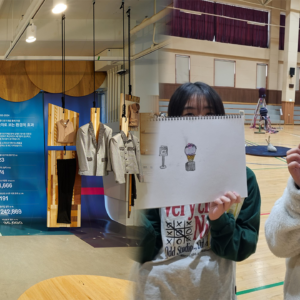삶에서 대부분의 인연은 오래 사귀었어도 쉽게 잊히곤 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잠시 만났을 뿐인데도 오랫동안 이어진다. 나에게 개발경제학자 비자이엔다 라오(Vijayendra Rao)는 그런 인연이다.
2017년 5월, 당시 나는 UC 버클리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박사논문을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지도교수인 폴 피어슨의 안배로 캐나다 고등연구소(CIFAR)가 퀘벡 근교 몬테벨로에서 개최한 소규모 학술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20명 남짓의 학계 거장과 소장학자들이 사나흘간 숙박하며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술 출판으로 연결하는 자리였다. 나는 유일한 대학원생이자 서기로 이 모임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당시 세계은행 경제학자였던 비자이엔다 라오였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애칭으로 ‘비쥬’라 불렀다. 비쥬는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의 균형, 경제학에 기반을 두되 사회학·인류학·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 열린 태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 자세를 몸소 보여줬다. 무엇보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겪고 사용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배운 것이 워낙 많았기에, 국제개발이 내 직접적인 연구 분야는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나는 비쥬의 연구를 꾸준히 지켜보게 됐다.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의 리드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그는 2025년을 끝으로 은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는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논의하는 정상급 회의가 열렸다. 44개 동맹국 730명의 대표단이 약 3주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했다. 이때 설립된 기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1944년 설립 이후 세계은행은 시대에 따라 역할을 달리해 왔다. 20세기 중반에는 유럽과 일본의 전후 재건을 지원했고,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개발 분야에서 ‘은행’이라 하면 곧 세계은행을 뜻하게 됐다. 이 분야 종사자들이 세계은행을 그냥 ‘더 뱅크(The Bank)’라 부르는 이유다.
인도 출신인 비쥬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시카고대·브라운대·미시간대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미국 최상위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한 뒤 1999년 세계은행에 합류했다.
세계은행의 주축은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비경제학자들도 점차 이 기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하버드에서 인류학 박사와 의사(MD) 훈련을 받은 김용이 제12대 세계은행 총장으로 임명됐다. 정치인이나 금융인이 아닌 인물이 총장에 오른 첫 사례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처음 고용한 비경제학 배경 사회과학자는 1974년 채용된 루마니아 출신 사회학자 마이클 처니아(Michael M. Cernea)였다. 처니아 이후 문화적·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개발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본격화됐고,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제임스 울펀슨 총장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울펀슨 총장은 다방면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폴리매스(polymath)였다. 호주계 미국인인 그는 20대에 호주 펜싱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고, 시드니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월가에서 경력을 쌓은 후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됐다.
울펀슨 총장은 세계은행의 역할을 단순한 자금 제공 기관에서, 자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연구하고 더 나은 사용 방식을 함께 모색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비쥬가 대학을 떠나 세계은행에 합류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비쥬는 1999년부터 2025년까지 26년간 세계은행에서 ‘사람 중심의 개발 연구’를 담당해 왔다. 2025년 11월 18일, 그는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에서 지난 연구와 업적을 정리하는 고별 강연을 했다. 강연 제목은 ‘사람을 위한 정책(Policy for the People)’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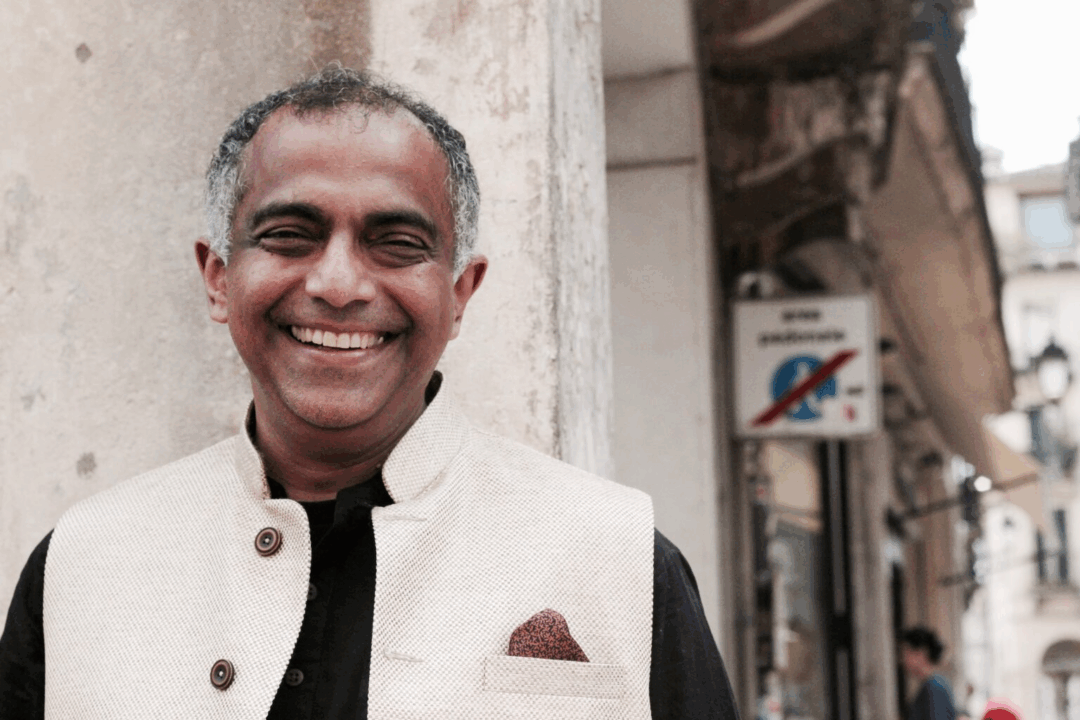
비쥬는 경제학(AER), 정치학(APSR) 같은 최상위 학술지와 캠브리지대·스탠퍼드대 출판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한 저명한 학자다. 그러나 그의 고별 강연에서 강조된 핵심은 학위나 실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정책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문제의 해법을 연구해 왔다. 개발 정책의 접근 방식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케인스의 ‘보이는 손’, 행동경제학과 현장 실험 연구, 이른바 ‘넛지’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엘리트주의다.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믿음, 성장과 고용 같은 경제 지표가 시민의 실제 경험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다. 경제학자이면서도 사회학·인류학·정치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비쥬는 이 두 가정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책 성공의 조건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책을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정책 문제 정의와 해결 과정에 함께 반영하는 일이다. 시민과 함께 진단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이상이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전문가의 지식과 데이터, 증거 기반 접근은 중요하다. 그러나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 경험과 아직 증거로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 역시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정책을 ‘안다’는 전문가의 확신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신호들을 보지 못할 때다.
정책은 소수에 의해 설계되지만, 그 결과는 다수의 삶에서 구현된다. 정책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요식업계에서 확산된 ‘팜 투 테이블(farm-to-table)’ 철학은 말한다. 재료를 이기는 요리는 없다고. 정책도 다르지 않다. 더 나은 정책은 더 나은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전문가와 시민은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어느 한쪽만이 완전한 답을 쥐고 있지는 않다. 결론은 전문가가 무효하다는 것도, 시민이 항상 옳다는 것도 아니다. 서로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길이다.
김재연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정책학과 교수
| 필자 소개 학계와 실무를 모두 경험한 미국의 정책학 교수이자 공공 영역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UNC Chapel Hill)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가르치며, 이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저소득층이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 미시간대 포드 스쿨의 객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존스홉킨스 SNF 아고라 연구소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연구하는 ‘현대의 아고라’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