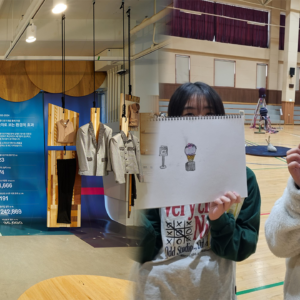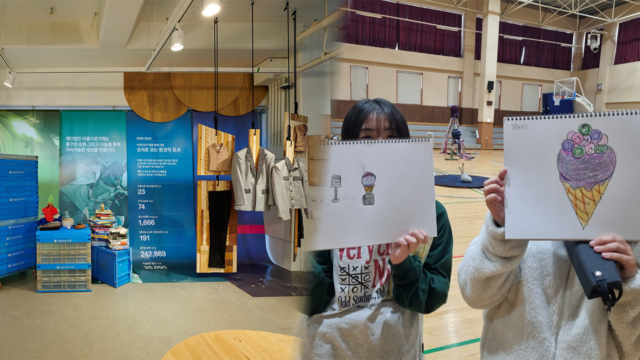6월 2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중앙도서관). 휠체어를 탄 기자의 뒤로 기다리는 줄이 늘어섰다. 양보를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로욜라 도서관 출입구 폭은 83cm로 휠체어의 폭(68cm)을 고려하면 여유 공간은 고작 15cm에 불과했다. 좁은 입구에 맞도록 휠체어의 각도를 조정할 때 마다 바퀴를 굴리는 손이 계속 문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휠체어에 걸어놨던 가방까지 문에 걸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출입문을 온전히 빠져나오려면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앞서 서강대는 36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국립특수교육원, 2015)’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두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굴리며 이동체험을 한 기자에게 교정은 험난한 장애물 코스와 같았다.
◇장애인 이동권 제약,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문의 유효폭은 80cm다. 대부분의 대학이 설계도면상으로는 이 편의증진법을 준수했다. 하지만 더나은미래 청년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기자재이나 벽의 위치 때문에 실제 출입문의 폭은 그보다 좁은 경우가 허다했다. 서강대 도서관 화장실은 문 뒤에 청소도구함이 있어 최대한 열어도 79cm밖에 되지 않았다. 대형교양강의가 많이 열리는 김대건관 역시 문에 걸린 걸쇠 때문에 실제 폭은 77cm에 불과했다.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인 박지원(가명·27)씨는 “도서관 출입구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대학 엘리베이터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건물 설계가 아직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와 함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성수(가명·22)씨는 인문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애를 먹는다. 벽이나 기둥 때문에 강의실 대부분이 문을 완전히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당겨서 여는 문은 내게 닫힌 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생들은 불편한 이동 환경 때문에 학습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일반 대학생이 흥미나 적성을 바탕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과 달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은 진입로와 동선을 고려해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해당 강의실의 출입문 또는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이전 수업 강의실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제 시간 안에 도착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는 어떨까. 전체 학생의 8%가 장애인인 독일 쾰른대학교의 경우, 건물 대부분에 보행자를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여닫이문과 똑같이 생겼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준다.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문을 열 수 있는 버튼도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법을 얼마나 준수했는가보다 장애인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박장우 차장은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안은 정부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면서 “실장애인 권리증진 효과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대학교 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면서 “시행규칙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개정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이동의 실태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김준영∙김진희∙이다비 더나은미래 청년기자 (청세담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