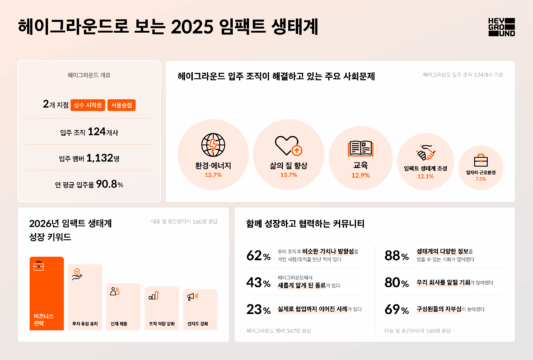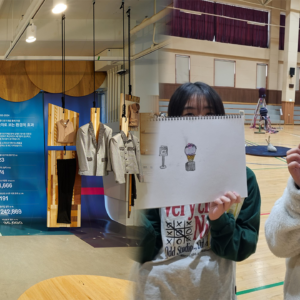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태계에 들어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확장해 왔을까요. 2026년 신년을 맞아 <더나은미래>는 사회혁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이동을 따라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개인의 이력을 넘어, 임팩트 생태계가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고 붙잡아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더나은미래> 창립 멤버이자 사회혁신 R&D 기업 이노소셜랩을 이끌고 있는 고대권 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임팩트 커리어 릴레이 인터뷰 <1>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
“해결책을 찾는 만큼, 질문을 누가 던질지 고민해야 한다”
“사회문제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는 속도는 늘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R&D 기반 접근이었죠.”
사회혁신 R&D 기업 이노소셜랩을 이끌고 있는 고대권 대표의 말이다. 공익 전문 기자로 사회혁신 현장을 기록해 온 그는 2015년 이노소셜랩을 창업하며, 관찰과 취재의 자리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다루는 연구·설계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기록에서 현장으로…지식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다
고 대표가 사회혁신 생태계와 처음 연결된 계기는 ‘영화’였다. 영화 평론을 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홈리스들과 함께 저자를 초대해 인문학 책을 보는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경험은 CJ그룹과 함께 지방 분교에서 사흘간 영화를 제작하고, 마을에서 상영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그는 2010년 3월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에 합류해 창간호부터 2년간 공익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기자 시절을 돌아보며 지면 기획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당시 8면으로 발행되던 신문에서 광고가 실리던 마지막 면을 비워, 조명받지 못한 작은 조직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두 번째 표지’처럼 활용했다”며 “몇 차례에 그치긴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조직의 사업들을 알렸던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사회혁신 생태계를 취재하고 기록해 온 그는 결국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영화 평론보다 제작에 더 끌렸던 것처럼, 사회혁신도 기록보다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로 일하며 쌓은 네트워크와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직접 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노소셜랩에서 고 대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적 연구로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19년부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하며, 평가를 넘어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Beyond ESG’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2020년에는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사회문제 정의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 프로젝트 ‘어떤 시작’을 추진했다. 사회혁신 전문가 16명을 인터뷰해 소셜섹터에서 문제 정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리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는 공공–민간 자원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왜’를 묻는 기자의 습관, 일의 방식이 되다
고 대표는 지금의 일하는 감각이 기자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핵심은 질문의 방식이다. 그는 “정부나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충분한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두 곳뿐이라는 정보를 보면, 기자는 자연스럽게 ‘왜 두 곳밖에 없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며 “그 다음엔 종사자 한 명이 하루에 몇 건의 아동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질문의 감각은 지금도 이어진다. 그는 “인터뷰나 미팅을 할 때도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실제로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게 된다”며 “아직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진다는 말을 듣곤 한다”며 웃었다.
고 대표는 이러한 질문의 힘이 사회혁신 생태계 전반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최근 솔루션 중심의 담론이 강화되는 반면, 어떤 질문이 먼저 던져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전처럼 ‘답’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에서는 질문 자체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해결책을 찾는 노력만큼이나, 그 질문을 누가 던지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하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생태계의 지속성을 말해준다”
고 대표는 임팩트 커리어를 둘러싼 조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2010년 전후만 해도 이 영역의 커리어는 ‘설계’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때그때 자리를 옮겨 다니는 방식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는 “지인 소개로 NGO에 들어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웠다”며 “지금처럼 중간지원조직이 있거나 다음 단계를 안내해 주는 구조는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간지원조직과 언론, 투자자, 새로운 자금과 전문가들이 등장하면서 임팩트 커리어 역시 하나의 산업 안에서 이력을 쌓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는 생태계 차원에서 커리어 경로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정감이 생긴 만큼, 때로는 이 일이 지나치게 ‘직업적인 혁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 일하는 방식과 커리어 경로가 점차 정형화되면서, 혁신마저 하나의 트랙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대로 향한다. 그는 “이제는 이 분야의 ‘어른들’을 찾아다니기보다, 막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이들을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지를 묻고 싶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미래에 이 생태계에서 계속 일할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생태계가 지속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2026년을 맞아 올해의 목표를 묻자, 그는 거창한 계획보다 방향을 이야기했다. 혁신에 이르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다양성’과 ‘연결’을 꼽았다. 고 대표는 “조직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옹호하고 싶다”며 “익숙하지 않은 것, 내 것이 아닌 것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