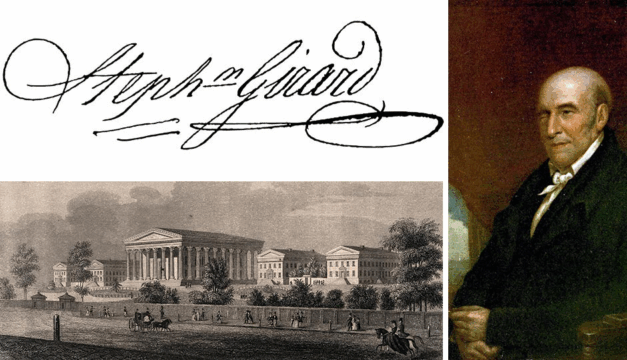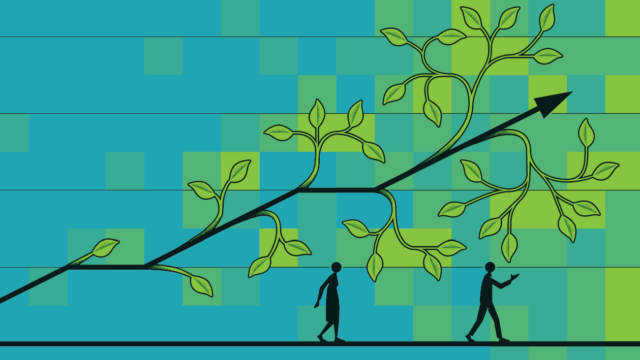요즘 투자자들을 만나면 비슷한 문장이 돌아옵니다. “시장, 아직 안 풀렸죠.” 그 말이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먼저 식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2021년 15.94조원에서 2022년 12.47조원, 2023년 10.91조원으로 내려간 뒤, 2024년에 11.95조원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탄약’에 가까운 벤처펀드 결성액은 2021년 17.85조원에서 2024년 10.56조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장의 체감과 가까운 민간 데이터는 더 냉정합니다. THE VC는 2025년 상반기(포스트 IPO 제외) 투자 455건, 2조24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37.6%, 금액 -26.9%라고 집계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 축소의 충격은 누구에게 먼저 가는가?’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하겠습니다. 초기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는 ‘유망하다’는 말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실증, 인증, 규제, 공급망, 공정 전환… 이 모든 걸 통과해야 비로소 매출이 생기고, 그다음에야 ‘스케일업’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험자본이 줄어드는 시기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시간’입니다. 기후테크는 그 ‘시간’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슈페이퍼가 이 구조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중 Seed·Pre-A가 62.4%, Series C 이상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초기에서 멈추는 비율’이 높은 생태계에서, 모험자본의 겨울은 그 약한 다리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후테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후테크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투자에서 밀린다.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큰 만큼, 시장이 단독으로 가격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간자본은 “좋은데, 아직은…”에서 멈춥니다.
◇ 대안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돈이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투자 확대’ 구호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먼저 떠안느냐의 설계입니다. 국제 임팩트 투자/개발금융 영역에서는 이를 흔히 ‘혼합금융(Blended finance)’라고 부릅니다. 민간자본이 선뜻 들어오기 어려운 구간에 공공·기부 등 촉매적 자본(Catalytic capital)이 먼저 들어가 위험을 흡수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이죠.
특히 ‘선손실(first-loss)’은 설명이 직관적입니다. 누군가가 첫 손실을 감수해 주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같은 자산을 더 “투자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GIIN은 이를 공동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촉매적(first-loss) 신용보강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놓치는 자원이 ‘기부자금’입니다. 기부는 보통 ‘소진되는 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설계를 바꾸면 기부는 시장 형성의 ‘리스크 흡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부가 선손실·인내자본·촉매자본 역할을 하며 초기 기후테크의 ‘첫 번째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상론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미 제도와 거래구조로 축적돼 온 논의입니다.
◇ 기부가 투자 재원이 되면 생기는 일
큐네스티(前 한국사회투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부펀드 ‘임팩트퓨처’를 통해 ESG·기후테크 등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해 왔고, 이 기부재원이 모험자본이자 인내자본·촉매자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구조가 특히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대개 같습니다. 시장이 망설이는 ‘초기’ 구간입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넷제로 챌린지 X’에서 한국사회투자는 Tier1 투자기관으로 참여했고, 2025년에는 305개 지원 기업 중 5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중 한국사회투자가 초기 단계에서 발굴·투자한 4개 기후테크 기업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 해 동안 3개 이상 기후테크 기업을 투자한 기관은 참여기관 중 한국사회투자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투자한 기관’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왜 먼저 투자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기부가 투자 재원이 되면, 단기 수익성의 잣대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초기 기후테크에 시간을 사줄 수 있는 자본이 됩니다. ‘착한 돈’이라서가 아니라, 시장 실패가 큰 구간에서 선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초기 기후테크가 투자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누가 어떤 성격의 돈으로 다리를 놓을 것인가?” 그 답이 없으면 ‘모험자본의 겨울’이 끝나도 봄은 오지 않습니다. 얼어 죽은 씨앗은 봄에 다시 발아하지 않으니까요.
이순열 큐네스티 대표
| 큐네스티(前 한국사회투자)의 <임팩트의 좌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자본을 임팩트 기업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과연 ‘진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임팩트 투자가 일반적인 벤처 투자와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이며, 자본의 출처는 어떤 철학을 담고 있고, 그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시선으로 도달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임팩트’라는 단어의 무게에 걸맞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팩트의 좌표> 시리즈는 한국 임팩트 투자의 현재 위치와 그 좌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로를 함께 모색합니다. 기술, 환경, 사회서비스,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되고 있는 임팩트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며, ‘임팩트’라는 단어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전이 가능한 사회적 변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