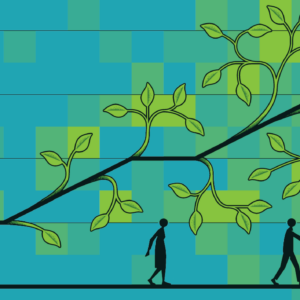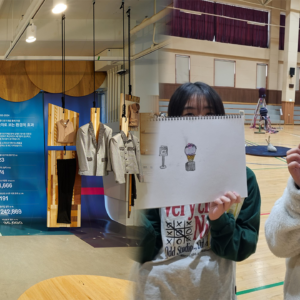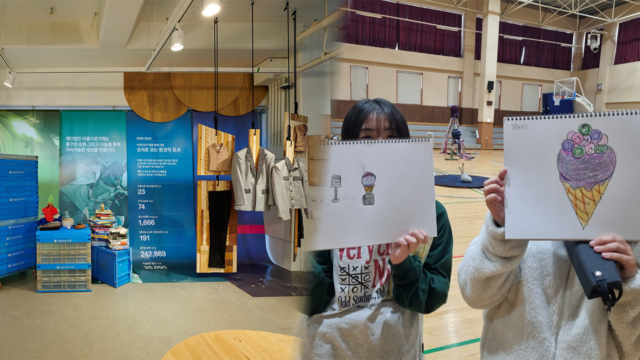“‘프렌즈인터내셔널(Friends International)’은 법적·행정적으로 ‘NGO’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소셜 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로 규정합니다. 이때 ‘엔터프라이즈’란 말은 ‘기업’이라기 보다 어원인 프랑스 어 동사 ‘entreprendre’의 뜻과 관련있습니다. 즉 ‘무언가에 착수해 그것을 계속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곳’이란 뜻이죠. 물론 기업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개발협력(ODA) 비영리단체 프렌즈인터내셔널의 니콜라이 슈바르츠 소셜 비즈니스 부문 책임자는 단체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캄보디아 거리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렌즈인터내셔널은 2001년부터 ▲레스토랑 ▲업사이클링 수공예품점 ▲모터사이클 수리점 ▲양장점 ▲가전제품 수리점 ▲네일아트숍 등 다양한 소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슈바르츠는 “거리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셜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면서 “자립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과 일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열매나눔재단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개발협력NGO,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슈바르츠를 만났다. 그는 10년 넘게 DHL 등 일반 기업에서 일한 뒤, 2012년 캄보디아로 이주해 8년째 프렌즈인터내셔널의 소셜 비즈니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거리 청소년들 요리사로 키워 자립시키는 ‘트리 레스토랑’

1994년 캄보디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프렌즈인터내셔널은 다른 ODA 단체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급했다. 슈바르츠는 “설립자인 세바스티앵 마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밥을 짓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얼마 안 가 자기처럼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돌아다니면 하루에 네다섯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에게 ‘길 위의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없었다. 프렌즈인터내셔널은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거리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선적인 방식(charity approach)이 아니라 개발 방식(developing approach)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했다”면서 “고민 끝에 아이들이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요리학교 겸 레스토랑을 운영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렌즈인터내셔널은 2001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트리(Tree) 레스토랑’ 1호점을 열며 소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레스토랑에 훈련생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은 캄보디아 전통 요리부터 프랑스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 교육을 받았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직접 손님에게 서빙하며 실전 감각도 키웠다. 슈바르츠는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이들이 실제 사회가 어떠한지 미리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사회에 던져졌을 때 좌절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매년 4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트리 레스토랑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이중 일자리를 구해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은 95%에 이른다.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해 라오스, 미얀마에서 6개 지점의 트리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트리 레스토랑 모델을 더 많은 지역에 전파해 트리 레스토랑 브랜드를 ‘소셜 프랜차이즈‘로 만들 계획입니다.”
◇비영리가 비즈니스 잘하려면? ”소셜 미션 지키면서 제품 퀄리티 높여야”
슈바르츠는 비영리 단체가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비즈니스에 몰두하다 보면 비즈니스의 목적이 수익을 내는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즈니스 성과가 올라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될 때 균형을 잃기 쉽다. 그는 “비즈니스를 하며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소셜 미션에서 멀어진다면 큰 문제”라며 “자칫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셜 미션’을 마케팅 수단으로 남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소셜 미션에만 집중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만든 착한 물건이니 사람들이 기꺼이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품성이나 시장 경쟁력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NGO스러운(NGO-y)’ 제품을 생산한다”면서 “소비자들도 몇 번은 선의로 이런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더 이상은 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 기업들과 경쟁해도 시장에서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 트렌드를 읽고 이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가 비즈니스로 돈을 번다’는 데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그는 “처음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캄보디아의 다른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프렌즈인터내셔널이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며 “그때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비영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슈바르츠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러한 인식에 맞서 적극적으로 소셜 비즈니스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비즈니스가 비영리 단체들이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재단들의 입장에서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단체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는 “특히 기업 재단들은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로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편”이라며 “외부 기금이나 후원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프로젝트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