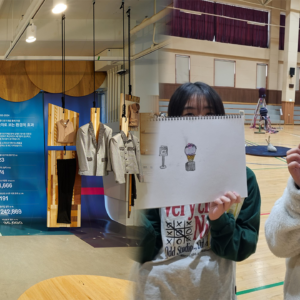AI 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 의사결정까지 대체하는 시대다. 생성형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법률 자문을 하고 심지어 상담사처럼 말한다.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사용량은 2023년 대비 14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AI가 사람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영역의 증가 등을 분석했고 “AI가 학습, 판단, 창작의 모든 영역을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기술이 불평등을 가속할 때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Geoffrey Hinton)은 “AI가 향후 30년 내에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이 10~20%에 달한다”고 말했으며,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아주 위험한 종류의 AI가 등장할 것이며, 세상을 우리로부터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만(Sam Altman)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 그리고 수백명의 AI 전문가들은 “AI는 팬데믹이나 핵전쟁과 유사한 멸종의 위협”이라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AI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문명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AI는 곧 직업의 종말을 예고하고, 언어·감정·윤리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의 삶을 다시 쓰는 시대를 열고 있다.
AI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 아래 쓰느냐에 따라 기술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술 발전은 자본에 더 큰 힘을 쥐어주고 소수의 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더 구조화될 수 있다. 실제로 AI는 노동이 아닌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플랫폼 독점은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알고리즘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인종, 성별, 지역, 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맥킨지 보고서는 “AI는 고숙련 인력의 생산성은 극대화하지만,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를 먼저 대체할 수 있다”고 했으며 브루킹스 보고서는 “AI 기술이 미국 내 백인과 흑인 간의 자산 격차를 매년 430억 달러까지 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모든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방향타가 될 사회적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바로 비영리다.
◇ 비영리 현실, 기술 간극을 돌아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국내 다수의 비영리기관 종사자들은 여전히 AI를 단순한 검색 도구, 혹은 사무자동화의 일부로만 인식하는 데 그친다. AI를 통해 30분이면 끝낼 코딩작업을 수작업으로 엑셀 수식을 넣으며 몇 시간씩 처리하거나 비영리기관에서 추진하는 다방면의 사업들은 ‘대면 작업’이라는 이유로 비효율을 자처한다. 물론 이러한 대면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이 간극의 원인은 단순한 시간이나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 “비영리는 기술변화가 늦어도 괜찮다”는 고정관념과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시도 부족”에 기인한 건 아닐까.
구글닷오알지(Google.org)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는 600건 이상이며 이는 2018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다. 실례로 인도의 NGO 아르맨(ARMMAN)은 AI 기반 예측시스템을 도입해 임산부 중 건강 취약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콜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여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90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 도달했고 철분섭취율은 25% 증가했다.
미국의 비영리교육플랫폼 퀼(Quil)은 AI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와 독해 능력에 대해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사들이 취약 학생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의 1만2000개 학교에서 890만 명 이상이 이 툴을 사용하고 있다. 또 AI는 홍수 예측, 교통신호 최적화, 온실가스 실시간 추적 등에서 활용돼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직접적인 보호와 행동 기반을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영리 영역에서도 이 변화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글로벌 모금플랫폼 펀드레이즈 업(Fundraise Up)은 AI 기반 후원자 예측을 통해 평균 기부액을 40% 이상 끌어올렸고 유니세프 호주는 발송 대상을 최적화해 기부 수익이 26% 늘었다. 그린피스 역시 캠페인 반응을 강화하는 데 AI를 활용했다. 그러나 한국의 비영리에서 AI를 적용한 도입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최근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와 기술 협약을 맺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잠재기부자를 타겟팅 분석하여 기부자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부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대상에 따라 더 적합하게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이 과정과 경험을 연구물로 남겨 비영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름다운재단의 노력은 한 기관을 넘어 한국 비영리계가 AI에 접근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 비영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AI발전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는 무엇보다 이 변화와 속도를 주의 깊게 보고 학습함과 동시에 인식의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비영리는 기술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AI에 접근해야 한다.
첫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AI기술 논의의 출발점은 각자 조직의 미션이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 기부자, 파트너와 함께 AI를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야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원칙을 만든다. AI를 사용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언하고 실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셋째, 신뢰를 만든다. AI의 정밀한 타게팅 분석이 공감을 대신할 수는 없다. 숫자 너머 한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야기와 피드백으로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 조직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조직의 AI기준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가능하다면 공통의 거버넌스로 함께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대가 있어야 AI시대 공익 생태계가 지켜질 수 있다.
기술은 사회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궁극적 방향은 오직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치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AI시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가? 불평등과 소외의 경계에 놓인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과연 이들을 돕고 있는가? 비영리는 그런 질문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래도록 던져야 한다. 그것이 AI시대, 비영리가 비영리답게 존재하는 방식이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 필자 소개 아름다운재단에서 15년간 근속하고 2023년 내부선발 1호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 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제’가 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