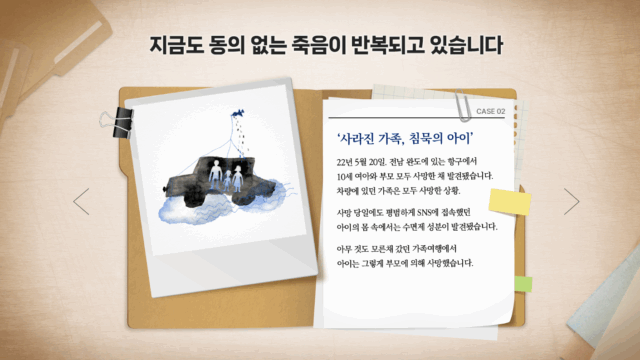중학교 때였다. 늦은 여름날, 학교에서 단체로 야영을 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친구들과 운동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던 게 기억난다. 밤하늘을 그렇게 오래 바라본 건 처음이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또렷해지던 별들. 어쩌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친구들과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시 밤하늘을 제대로 본 건 지난해 몽골 취재를 갔을 때였다. 저녁까지 비바람이 몰아쳐서 별 보긴 글렀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더니 까만 하늘 위로 별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밤하늘을 뒤덮은 별들을 보며 그저 작은 탄성만을 내뱉었다. 그때 알았다. 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별을 보는 게 어렵다는 걸.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일행 중 한 분이 손가락으로 먼 하늘을 가리켰다. 북두칠성이 거기 있다고 했다. 찾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몽골의 북두칠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렷해서 단번에 국자 모양을 발견했다. ‘이번 건 좀 더 어려운 별자린데’라고 운을 떼더니 다른 곳을 가리켰다. 수많은 별이 정신없이 얽히고설킨 그곳을 한참 동안 헤맨 끝에 찾아냈다. 꼬리와 머리, 활짝 편 양 날개. ‘백조자리’였다.
‘코로나맵’ 서비스가 처음 나온 건 지난 1월 말이었다. 정부에서 내놓는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가 산발적이고 정돈되지 않아 시민의 불안감만 키우던 와중에, 한 대학생이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을 만들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 사람들의 제보 등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긁어모아 좌표를 찍고 그걸 선으로 이어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한 점씩 좌표를 찍어나갔을 그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문득 그날 밤의 백조자리가 떠오른 것이다.
‘흩어지면 데이터, 모이면 임팩트.’ 평범한 시민들이 수십개의 코로나맵과 마스크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파편적인 데이터 그 자체로는 별로 힘이 없다. 목적과 기준을 갖고 수집된 양질의 데이터에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보기 좋게 가공돼 세상에 나올 때, 비로소 데이터는 힘을 갖는다. 어렵고 고된 시기일수록 그 힘은 더 강력해진다. 별자리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데이터라는 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전혀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장 blindletter@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