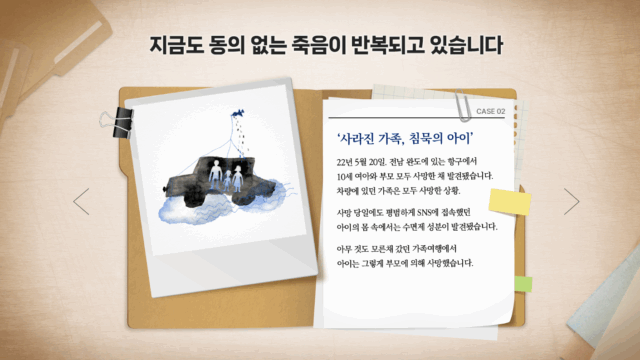[공익신고의 세계] 공익신고자 보호법있지만 위반해도 벌금형이 대부분 내부에선 보복에 해고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들이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지 50일째다. 공익제보자들의 문제 제기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시설장까지 교체됐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새 운영진이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지시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도 삭제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일부터 까다롭다. 또 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누가 배신자인가 대기업의 발전소 설비 담합을 폭로한 A씨. 그가 처음부터 공익제보에 나선 건 아니다. 2014년 사내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찰을 주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측은 고객사 협박과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효성과 LS산전 등이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공익제보자가 겪는 고통은 가혹하다. 제보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제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