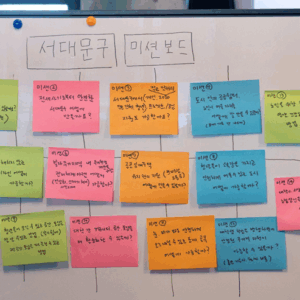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소셜섹터’나 ‘임팩트 생태계’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작 내가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업무 특성상 소셜섹터 내 여러 소식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붕 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만드는 임팩트가 선명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업무 중 느끼는 혼란한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쩌면 그 시기를 이미 통과해 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보다 그저 지금 나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그대로 꺼내어 보고 수용 받는 경험이 필요했다.
그런 시기에 소셜섹터 활동가들의 네트워킹 모임 ‘D.MZ’에 참여하게 됐다. 직장 밖 동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또래들과 편안한 대화 그 자체로 기대됐다. ‘D.MZ’는 첫 모임부터 ‘익명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닉네임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원치 않으면 굳이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됐다. 모임 중간중간 우리를 안심시키는 운영진에게서 이곳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덕분에 경계를 허문 채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뭘 굳이 잘 하지 않아도, 슬쩍 약한 모습을 내비쳐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모임은 3주간 매주 수요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진행됐다. 지금까지도 각 회차가 제법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특히 다 같이 빙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첫 모임이 인상적이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일제히 나를 향하던 시선들, 그 눈빛과 표정을 보면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막 만난 사이라는 것,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생태계엔 이렇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싶었다. 이들과 같은 활동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 생태계의 일원이어서 다행이었다.
내 안에서 빙빙 돌던 고민을 직장 밖 동료들과 나눈 뒤에, 내가 만드는 임팩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됐다. 언젠가부터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내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적당히 포기하게 됐지만, D.MZ 안에는 내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고, 그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D.MZ를 통해 참여자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네트워크 모임의 필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점처럼 흩어져 있는 활동가들을 모아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 2030 활동가들이 이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 같았다. 지금 네가 일에서 느끼는 혼란한 마음이 온전히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나 역시 겪어봤거나 현재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자, 비로소 이 생태계 안의 ‘우리’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 발붙인 마음이 됐다.
최한빛 마이오렌지 콘텐츠에디터
| D.MZ(뎀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셜섹터의 MZ 활동가들이 활동을 둘러싼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무장해제하고, 또래 활동가들과 일과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MZ 활동가들이 보내온 기고문을 ‘D.MZ 칼럼’으로 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