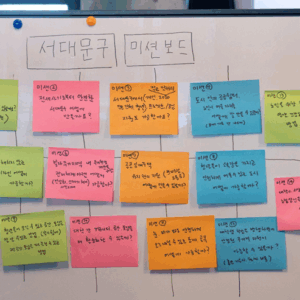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김귀동 적십자 서울지사협의회장] 피 안 섞인 남남인 데8년째 가족처럼 살아
적십자 봉사 16년째 1만5000시간 활동
어려운 사람들이 남 돕는 것 더 좋아해

“적십자 노란 조끼가 맺어준 인연이에요. 이제는 가족이지. 당신이야 나한테 늘 무척 고맙다고 하지만, 나도 또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 몰라. 이러다 그 양반 아프거나 먼저 떠나기라도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야….”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씨는 두 달 전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1일, “노인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김씨가 보채는 통에 함께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 “그래도 수술 결과가 좋아 한시름 마음을 놓았다”며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적십자에서 봉사한 지는 올해로 16년째, 지금까지 봉사한 시간만 합쳐도 1만5000여 시간이 넘는다. 1997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바로 그해에, 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당시 서울 마장동 동장이었던 박정기씨가 다짜고짜 적십자를 하라고 설득한 게 인연이 됐다. 적십자가 뭔지도 잘 모른 채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어느새 적십자 봉사회 서울지사협회의 회장직까지 맡게 됐다.
지난 16년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인연들은 혈혈단신으로 두 아이를 키우던 김씨에게 남편의 빈자리, 형제들의 자리를 채워주었다. “없는 분들이 그렇게 남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기초수급생활권자한테 국가에서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5개 나오는데 그걸 모아두었다가 주기도 하고, 얼마 전엔 동네 과일가게에다 5000원을 맡겨두며 저한테 바나나 주라고 했다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코끝이 찡하죠. 봉사가 마냥 주는 것 같아도 받는 게 훨씬 커요.”
일상이 된 김씨의 나눔과 봉사는 자연히 아이들에게도 이어졌다. 김씨는 “집이 연립주택 4층인데 폐지를 주워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경동시장 언덕 쪽으로 지나가는 시각이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도 아들이 늘 뛰어내려가 같이 밀어 드린다”며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헛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느낀다”며 특유의 천진한 미소를 지었다.
‘돈 한 푼 받지 않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해왔느냐’는 물음에, 김씨는 마치 비밀을 이야기해준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봉사하는 것은 꼭 마약 같아. 그 기쁨을 한번 알고 나면 쉽게 관둘 수가 없거든. 밑반찬을 아주 맛있게 해서 통에 담아 주러 가면서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면…. 그 기쁨은 정말 안 해보면 몰라. 만나서 얘기하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그게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훨씬 더 오래오래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