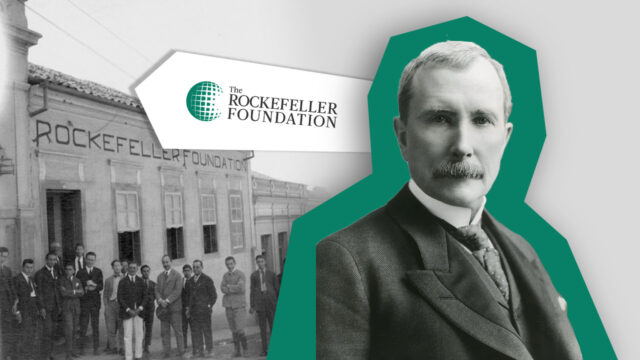글래스고 기후회의가 지난달 13일 막을 내렸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6년 만에 열린 당사국총회가 협상 마감 시간을 하루 남기고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약속은 거창하지만, 산출물은 미흡하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평가대로 단계적 탈석탄이 아닌 석탄 감축에 머무른 합의와 기온 상승 폭 1.5도를 훌쩍 넘긴 2.4도를 허용해버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현재의 고통을 미래에 전가하며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었다.
아쉬운 가운데 몇 가지 진전도 눈에 띄는 진전도 있었다. 6년이란 시간을 끌어온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 규칙’이 완결되면서 국제 탄소 시장이 활성화될 길이 열렸다. 기껏 탄소를 배출해 놓고, 탄소 교환권을 매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섬나라 정상들이 ‘원조가 아닌 보상’을 시행하라며 ‘오염자 부담 원칙’을 들고나온 것도 눈에 띈다. 기후위기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권리를 침해당한 주권자로서의 자기 인식의 출발이다.
그간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가난한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국들에게 손실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부유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보상이 아닌 국제협력’으로 선을 긋고 있다. 부자로서 의무는 하겠지만, 잘못해서 비용을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주머니에서 빼서 쓰나 저 주머니에서 빼서 쓰나, 부유국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같은데, 왜 지원금으로 국한하는 것일까. 영국 개발협력단체 옥스팜(OXFAM)은 2017~2018년 공공 기후적응 지원금의 80%가 차관으로 지원됐다고 집계했다. 차관은 빚이다. 빌려 쓰는 동안 이자가 발생하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잃게 된다. 다시, 양극화의 골은 깊어진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많은 나라는 전후 국가의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끌어들였다. 발전소, 댐, 고속도로 등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독재자의 스위스 계좌를 채우거나 차관을 공급한 나라들의 이자 수익과 사업권 확보로 귀결되었다. 신생 독립국 민중에게는 갚지 못할 엄청난 부채만을 남겨주었다.
이런 연유로 1968년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원조 대신 무역(Trade not Aid)’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며, 조건부 원조와 차관 대신, 실질적인 거래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저감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슬로건은 이후 공정무역 운동의 태동과 제도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1990년부터 지난 25년간 상위 10%의 부자들은 52%의 탄소를 배출한 반면, 하위 50%의 빈곤층은 같은 기간 동안 단 7%의 탄소를 배출했다. 탄소를 배출하며 얻은 발전의 결과로 전기차도 만들고, 우주선도 띄우지만 그 과실은 극소수만의 것이다. 마지막 남은 힘은 모아, 스스로를 탈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걸지 말라. 손실을 보상하고, 그 재원으로 스스로의 발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망친 사람들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를 빈곤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