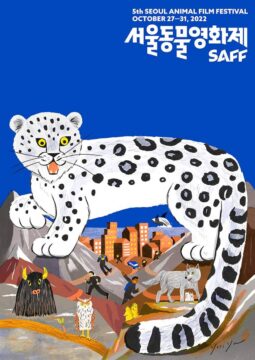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다트머스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전범선(28)씨는 요즘 강원도에서 동물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누구나 부러워할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던 전씨는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잘나가는 직장을 마다하고 의식성 짙은 노래를 지어 부르는 ‘양반들’이라는 밴드를 만들더니, ‘두루미’라는 문화 기획사를 창업해 독립 출판을 하고, 문 닫기 직전인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을 맡아 운영하고, 채식주의자가 되어 비건 스타일의 사찰 음식점을 차리고, 이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주창하는 ‘동물해방물결’에 참여해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삶을 ‘휘뚜루마뚜루(마음 가는 대로 이것저것 하는 모양) 방식’이라고 표현한다. “안정됐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삶보다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되 행복한 삶이 더 낫다”는 것이 이유다. 이를 두고 좌충우돌 청년의 방황으로 보는 이도 있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보면 하나같이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모습은 지역에 자리 잡은 밀레니얼 창업자들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화상과도 같다.
기성세대 눈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공동체 문제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창업자들에게선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로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활동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밀레니얼 세대가 갑자기 이타심에 충만해서 이러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끝자락에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취향과 공감, 그리고 플랫폼 경제에 익숙하다. 온라인의 콘텐츠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해왔다. 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 메신저처럼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거나 유튜브에 자신의 흥미로운 일상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네트워크 효과를 몸으로 아는 세대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업할 때에도 단기적 이익 올리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 일단 가치를 인정받기만 하면 전통적인 사업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소문이 나고 큰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기업 경영학에서는 한 손으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폼 나게 사회 공헌을 하는 게 정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역이나 사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매출을 낸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일과 삶이 맞닿아 있다. 기업 경영 자체가 사회 공헌이자 자아실현인 셈이다.
도시학자 경신원 박사는 “밀레니얼은 이전 어떤 세대보다 공익에 관심이 많다. 환경 문제, 빈곤 문제에 기꺼이 동참하여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이다. 이전 세대의 소비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미니멀리즘과 공유 경제를 이야기하는 세대”라고 말한다. 사유 경제 대신 공유 경제를, 소유보다 체험을, 가격보다 가치를, 독점보다는 나눔과 공감을, 쓰고 버리기보다 고쳐 다시 쓰기를 선호하는 세대가 만들어 가는 균형과 회복의 경제가 로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로컬의 비즈니스는 밀레니얼이 상상하는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들이 상상하는 미래는 산업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더 많은 부 창출’이 아니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하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일상 용품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 문법으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로컬의 비즈니스가 더 행복한 삶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