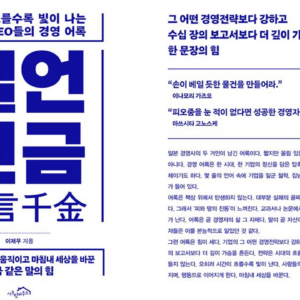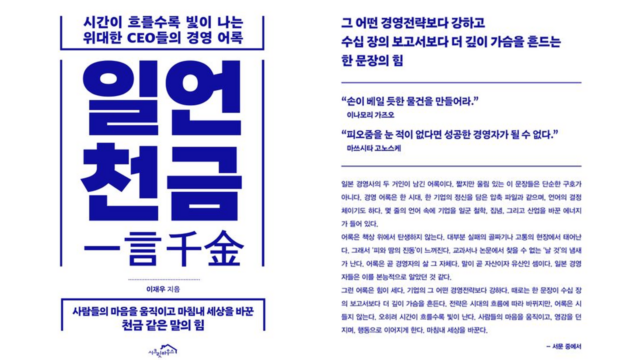[인터뷰] 박용준 글로벌케어 회장
“네팔 지진 때였어요. 1992년일 겁니다. 네팔은 산악 지형 국가라 외딴 마을이 많아요. 지역 주민한테 듣기론 의사라는 사람을 일평생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집이 멀어서 며칠을 걸어와 진료받고 또 그 길을 며칠씩 걷는 거예요. 캠프 마지막 날, 짐 정리해서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전날 진료받았던 한 부자(父子)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 아직 집에 가는 중인 거야.”
박용준(65) 글로벌케어 회장이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30여 년 전, 첫 해외 의료 지원 당시를 회상하면서다. 그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1997년 국내 첫 국제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를 설립한 그는 20년 넘게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구동산병원에 중환자 전문의 32명을 급파했다. 또 중환자실 설치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대구 지역 취약 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품과 반찬을 비대면으로 배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박 회장은 “누군가를 위한 배려로 출발한 NGO 활동이 이제는 책임감으로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국내 첫 국제의료 NGO 탄생
1994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의대 동기생이었다. 발신지는 르완다. “이곳에 와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다. 당시 르완다에서는 ‘인종 대학살’이 벌어졌다. 100일 만에 100만명이 죽고 난민이 300만명 발생했다. 박용준 회장은 의료팀 단장으로 르완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난민이라는 걸 처음 접했다. 이들을 돕는 국제 구호 NGO와도 처음 만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촌을 형성하고, NGO 100여 개가 달려들어서 각자 일을 나눠 해요. 그 광경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니, 이런 세계가 있다니!’ 딱 그거였어요.”
―무척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감탄만 나오는 거죠. 당시만 해도 한국의 국제적인 책임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선지 뭔가 시큰둥해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려고 하지도 않고, ‘한국이 왔구나’ 정도였죠(웃음). 그런데 일본에서 ‘암다(AMDA)’라는 국제의료 NGO가 왔더라고요. 소규모였지만 일본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현장에 NHK도 왔는데 저한테 일본 NG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랬어요.”
―일본이 부럽던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보건 의료 전문 NGO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 일본 단체를 유심히 지켜보게 됐는데, 일본은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공적 자금인 ‘자이카 펀딩’과 기업에서 모은 ‘재팬플랫폼’이라는 두 개의 돈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부러웠죠.”
―의료 캠프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르완다에서 콩고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키부호수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료 캠프를 꾸렸어요. 당시 난민 50만명 정도가 머물렀는데, 말라리아나 영양실조 환자가 많았어요. 난민촌에선 생사를 오가는 환자보다는 간단한 진료를 못 받아서 평생 불편을 겪거나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3개월간 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환자 특징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처럼 더운 지역에는 기생충 질환이 많아요. 환자들이 기생충에 영양분을 다 뺏기니까 피폐해지고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그래도 제3국에선 공통으로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3대 전염 질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멀게 느끼지만, 한국을 떠나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해요.”
‘의료 NGO’ 넘어 ‘사회개발 NGO’로
―90년대 이전에도 해외 의료봉사는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국내에 무의촌(無醫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료봉사도 주로 국내에서 이뤄졌죠. 이를테면 ‘강화도 주민의 유병률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요. 해외 의료 지원은 90년대 들면서 조금씩 이뤄졌죠. 의료인 중에서 국제 개발 쪽 전문가랄 사람이 없었어요. 1997년도에 서울평화상을 ‘국경없는의사회’가 받았는데, 언론에 코멘트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다르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의술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수준 높은 의료인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국제보건의료 NGO가 브리지 역할을 하죠.”
―국제 NGO를 만드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을 텐데요.
“꼬박 3년 걸렸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려면 인력, 행정, 재정, 노하우 등을 상당히 갖춰야 돌아가요. 국내 NGO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멤버를 구했습니다. 한국누가회 소속 의료인들이 많이 동참해줬어요. 그렇게 동료가 생기고 조직 구조를 짜고 적지만 예산도 확보했죠. 1997년도에 글로벌케어를 설립하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출범식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거든요. 국내에서도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으면서 재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때였어요.”
―20년 넘게 세계 재난 현장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발을 딛고 나니까 그제야 보이더군요. 코소보 사태, 터키 대지진, 인도 지진. 2000년대 들어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난민, 인도네시아 쓰나미, 중국 쓰촨성 지진, 아이티 대지진까지 정신없이 재난이 터졌어요. 때마다 의료팀을 꾸려서 현장으로 갔는데, 문득 한계를 느꼈어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자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 수준을 높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전 세계 10국에서 우리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특히 모로코에서는 결핵 퇴치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보건 의료 역량이 엄청 올라왔어요. 노하우도 굉장히 축적됐고요.”
―항상 보람찬 일만 있을 순 없었을 텐데요.
“코소보 난민 사태 때는 총상 환자가 많았는데…. 캠프로 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신을 지나칠 때도 있었죠. 사실 재난 현장에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나서야 구호팀이 도착하게 됩니다.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들어가니까요. 재난 현장에서의 덕목 중 하나가 ‘구호의 대상이 되지 마라’거든요. 그럴 때마다 의료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의료만으로는 안 된다?
“르완다 사태 때 ‘옥스팜’이 물탱크 세트를 들고 왔어요. 파이프 라인을 근처 호수에 꽂아서 물을 탱크로 끌어올린 다음에 정수해서 수도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환자 치료해도 유병률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데,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나니까 드라마틱하게 확 떨어져요. 예방 의학인 셈인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깨끗한 물, 식량, 의약품.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과거 ‘한국형 국경없는의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왔나요?
“이제 50% 왔다고 생각해요. NGO는 누구 하나 나서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부터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등 다방면의 사람들이 손을 보태면서 커다란 조직으로 성장하는 거죠. 글로벌케어 역시 의사들만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지원을 나가보면 질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의료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까지 커버하는 ‘종합 사회개발 NGO’로 키워내는 게 목표입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