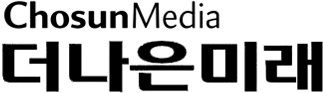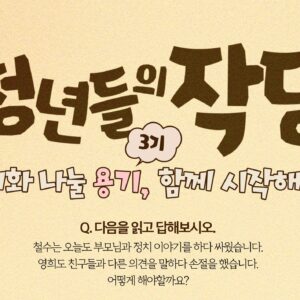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폭염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여름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다. 인도의 3·4월 기온은 190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유리창이 녹아내리고 새들이 체력 고갈과 수분 부족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전력난으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학교는 임시 휴교했다. 인도 정부는 연료 부족으로 여객 열차 운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파키스탄의 3월 기온도 평년보다 6~8도 올랐다. 1961년 이후 전례 없는 폭염이다. 파키스탄 재난 당국은 히말라야산맥 등 북부 지역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호수나 강에 떨어지면 쓰나미 같은 급류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을 초토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이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르피타 몬달 인도 공과대학 기후학 교수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염의 피해를 직접 입는 것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은 기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 지원 없이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10일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장관은 트위터에서 “선진국 정부에 그들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배출량의 1% 미만”이라며 “우리의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은 선진국의 자금 지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의 피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유엔재난위험감축국(UNDRR)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1%에 달한다. 선진국의 경우 0.1~0.3% 수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년 1.6%를 잃어 전 세계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개발도상국은 재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도 거의 들지 않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
파키스탄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15%는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35%는 국제사회의 재정적 보조가 있을 경우 줄인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아직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부자 국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지만 1850년대까지 범위를 넓히면 인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의 4~5%에 불과하다. 당시 야다브 장관은 “부자 국가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취약국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