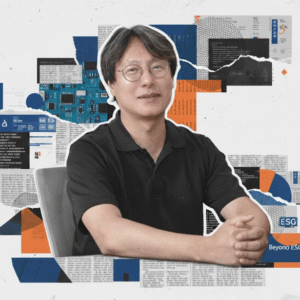![]() [공변이 사는 法] 이소아 변호사
[공변이 사는 法] 이소아 변호사

“지방에는 공변(공익변호사)이 거의 없어요. 사건은 많고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니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익 사건은 저희가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소아(40) 변호사가 최근 새로 단장한 사무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삼은 최초의 공익변호사다. 지난 2015년 5월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이하 동행)을 설립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익 사건을 무료로 수임해왔다. 그가 맡은 사건은 다양하다. 장애인이동권,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아동 학대,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나 홀로 사무실을 꾸린 지 올해로 5년째. 최근 후원 회원 500명을 넘겼고, 식구도 4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만난 이소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 산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첫 공익변호사 ‘깃발’
이소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다시함께상담센터, 민변 등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하며 공익변호사로서 근육을 단련했다. 그러다 2013년 별안간 귀향을 택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광주로 내려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는 그를 주변에서는 만류했다.
“언젠가 광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지역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공익변호사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심이 안 서던 차에 부모님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오게 됐죠.”
이 변호사는 광주로 내려와 지역 내 인권 단체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요청하라는 메모를 남겼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명함을 전하는 일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처음엔 의아해하던 활동가들이 하나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면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소문이 금방 난 편”이라며 웃었다.
단체를 설립하자 사건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어느 하나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 2016년에 맡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소송은 지금도 가슴에 맺혀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사례입니다. 중증장애인은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만 받고 있어요. 문제는 한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자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도서관도 즐겨 찾는 분이었는데, 지금 겨우 간병 지원만 받는 거죠.”
서비스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은 4년째 계속 되고 있다.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결정하면서 심리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변호사는 “사례자는 현재 이웃의 도움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변의 선의에 계속 기댈 수는 없다”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으려 여기저기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사회권 보장 위해 ‘지역 공변’ 늘어나야”
“전국에 공익변호사 수가 100명 남짓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해요. 각 단체가 협력하면서 주력 분야를 정해 보다 전문적으로 파고들기도 해요. 지방은 달라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건이 몰리다 보니 직접 공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단체 운영 비용 마련도 쉽지 않지 않은데요. ‘변호사인데 왜 후원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에 터를 잡고 고군분투 중인 이소아 변호사는 “활동 초기와 비교하면 스스로 변화한 점도 많다”고 말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활동 초반에는 최대한 소송으로 이어가 보려고 당사자를 강하게 설득한 적이 많았다. 그는 “지난한 소송 과정을 버티는 일은 물론 결과까지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며 “지금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의 선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익 소송을 하나의 운동으로 여길 만큼 공익변호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전에 ‘소송은 운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운동의 핵심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의 말이 결정적으로 가로막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법정이에요. 법정에서는 법률 용어로 입장을 전달해야만 받아들여지거든요. 공익변호사는 현실과 법정의 경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주문처럼 왼다는 이 변호사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중에도 공익변호사 활동을 이어간 이유도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그렇게 찾은 해답이 바로 공익변호사”라고 말했다.
이소아 변호사는 지역 공익변호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비쳤다. 가능성을 타진 중이긴 하지만 내년엔 동행 부산지부 개소를 꿈꾸고 있다.
“실무 수습을 마친 한 후배 변호사가 고향인 부산에서 공익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기회를 살려 다른 지역에서도 공익변호사 씨앗이 싹틀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역에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젠더 이슈만 하더라도 서울과 온도 차가 큰 게 현실이거든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해요. 지역사회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례 모니터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들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광주=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