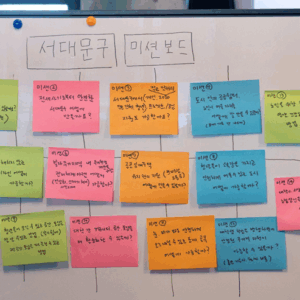네팔 ‘서비스포피스 여성文解학교’ “돈만 주면 나눔? 그건 진짜 나눔이 아니다” 수도 카트만두서 12시간 14년 내전의 땅 ‘살라히 ‘아동센터·문해학교 건립 작은 도서관에선 아이부터 노인까지 공부 희망을 밝히는 건 ‘교육’ “UN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힘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 30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혼 람 하리 조시(Hon. Ram Hari Joshi)씨를 만나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84세의 나이에 하얗게 센 머리의 하리씨는 어렸을 때 간디를 만나 사회활동에 눈을 떴다. 네팔의 교육부 장관과 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은 국제 봉사NGO인 서비스포피스(Service For Peace) 네팔의 회장을 맡고 있다. 기자가 네팔에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라는 얘기에 하리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 단어로 답했다. “그야 교육(Education)이지.” 그리고 말을 이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법이거든.” 순간 기자가 일주일간 네팔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모우따리의 서비스포피스 여성문해학교(Women’s Literacy School)에서 만난 강가 마야(46)씨는 46초를 들여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쓰곤 활짝 웃었다. 종이에 꾹꾹 눌러쓴 글씨는 마치 종이에 새긴 듯 쉽게 지워질 것 같지 않았다. 자나끼나가리 2구역 문해학교의 최연장자 드로나 쿠마리(62)씨는 4주 전에 문해학교를 찾아왔다고 했다. “아들과 딸 네 명을 기르고 모두 가르치고 결혼을 시킬 때까지” 60평생을 부엌과 밭, 외양간을 오갔던 드로나씨는 지금 네팔어 알파벳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 우리 말로 치면 ‘ㄱ·ㄴ·ㄷ’을 배우고 있는 셈이다. 두 여성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