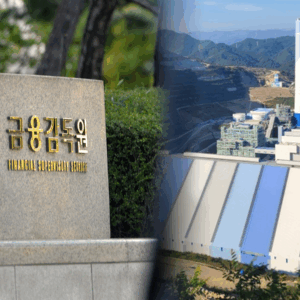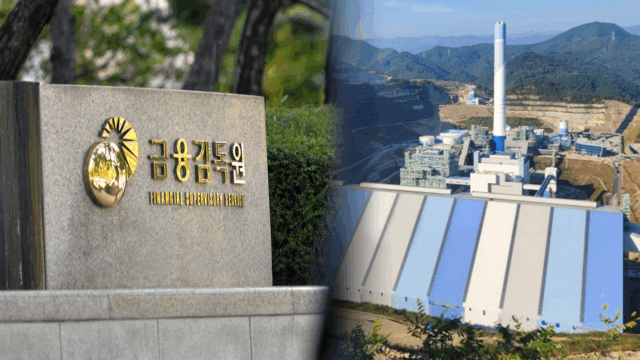다울림 강사들이 소개하는 다문화 요리 레시피 3탄―몽골 ‘호쇼르’ 다문화 요리강사 서드 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다문화 요리 강사, 서드 초롱입니다. 2011년부터 다울림 프로젝트와 함께 해왔어요. 강사들 중 가장 오래됐지요. 수익을 못 내던 시기에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저를 가족처럼 믿어준 학생들 덕분이었답니다. 저는 2006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전까지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나고 자랐지요. 보통 몽골하면 초원을 생각하지만, 제가 살았던 울란바토르는 도시랍니다. 몽골은 겨울이 긴 곳이에요. 한국처럼 사계절이 다 있긴 하지만, 더울 때는 정말 덥고, 추울 때는 정말 추워요. 바삭바삭 몽골식 튀김만두 호쇼르 호쇼르는 단연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특히, 몽골의 국가 행사인 ‘나담(Naadam)’ 축제 때 많이 먹죠. 나담 축제는 매년 여름(7월 10~12일 무렵)에 열리는데, 한국의 추석, 설날과 비슷한 몽골인들의 축제랍니다. 700여년이 넘을 만큼 역사가 깊고, 축제 기간에는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큰 행사가 열려요.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씨름, 활쏘기, 말 타기 등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대국민 운동회’와 같답니다. 추석 때 온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듯이, 몽골인들은 나담 축제 때 호쇼르를 만들어 먹어요. 반달 모양인 호쇼르는 여러 가지 크기가 있어요. ‘나담 축제’ 때는 ‘나미 호쇼르’라고 해서 어른 손바닥을 다 덮을 만한 커다란 크기로 만들어 먹지요. 평소에 가정에서 만들 때는 그보다 작은 아기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두를 빚을 때처럼 가장자리에 모양을 내는데, 아직도 저는 우리 어머니만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