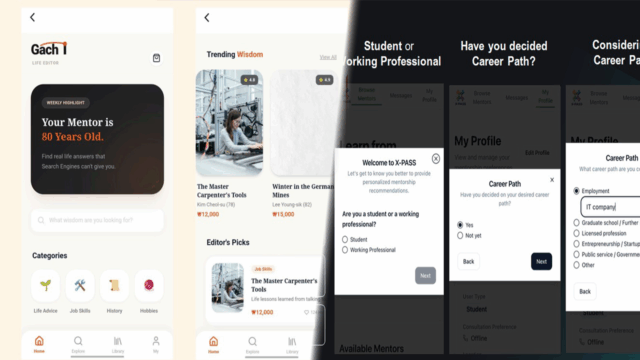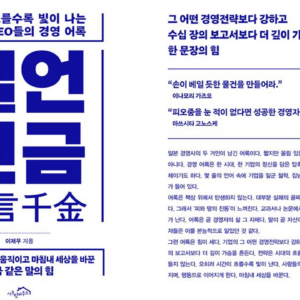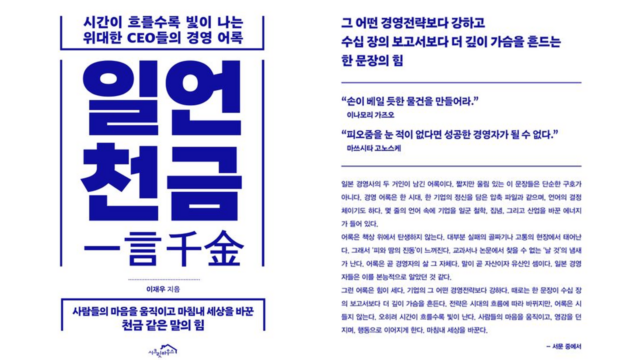‘패러다임(paradigm)’은 패턴, 예시, 표본 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παράδειγμα)에서 유래한 말로 ‘한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의 틀(frame)’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시대정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1962년 자신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이 책에서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에 의해 혁명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통명사화 되면서 상황이나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뜻하는 표현이 됐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로 천동설과 지동설을 들 수 있다. 지금이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16세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동설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도 산업혁명일 것이다. 과학혁명이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면서 구축된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다. 1760년대 기계의 발명으로부터 촉발된 산업혁명은 짧은 시간 안에 인류를 규정해 버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 대량생산 기계를 작동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이는 농촌의 노동력을 빨아들이면서 도시화를 가속했다. 엄마 아빠를 모두 공장에 뺏긴 아이들을 관리(탁아)해야 했기 때문에 공장 시스템과 똑같은 형태의 공교육이 등장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하교했다. 대량으로 생산해 대량으로 소비하는 순환경제가 작동하면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를 촉발했다. 그로부터 300년을 조금 못 채운 2012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자본주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인류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획일화된 공교육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산다. 기업은 여전히 대량생산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국가의 능력도 여전히 생산능력(GDP)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업혁명 패러다임은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산업혁명 이전 시대의 인구, 특히 자녀는 노동력과 동일시됐다. 자녀가 많아야 그만큼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량생산 기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생산성을 갖춘 노동력만 있으면 되지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 임신하고 출산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꾹 참고 양육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미래의 노동력도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도시화는 치열한 생존경쟁도 유발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욕구는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소속감 욕구에 앞서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율 역시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 소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정 인구는 유지돼야 한다. 부족한 노동력은 기술로 대체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라면 적정 인구 유지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출산율을 늘리거나,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북한과 통일하거나. 자존심 강한 한국인 정서상 외국인 이민은 쉽지 않다. 북한과 통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존경쟁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아를 찾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흩어놓아야 한다. 그곳이 바로 로컬이다. 그래서 로컬은 취향이 아니라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양경준 크립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