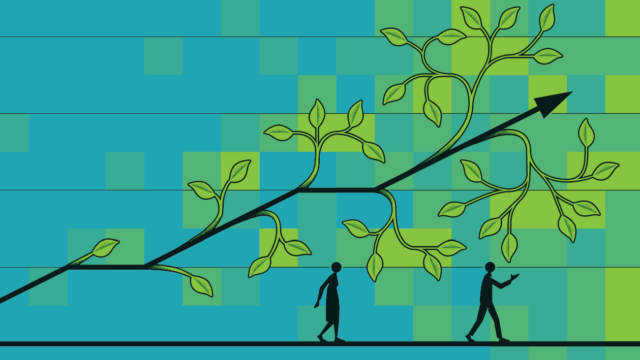우리는 ‘규제’라고 하면 보통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스스로 규제를 받으며, 시민도 정부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경험한다. 이를 ‘규정’이라 부른다.
법이 추상적인 명령이라면, 규정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복잡해질수록 시민이 감당해야 할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미국 미시간대 포드정책대학원의 파멜라 허드(Pamela Herd) 교수와 도널드 모이나한(Donald Moynihan) 교수는 이를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라 부른다. 행정부담이란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시간적·심리적·금전적 비용이다. 규정이 어려울수록,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시민은 더욱 큰 부담을 진다.
규정은 본래 적법절차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과거의 사건이나 사고를 계기로 규정이 추가된다. 문제는 소수의 사례를 막으려 만든 규정이 모든 시민에게 일괄 적용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정은 강제력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 디지털 정부의 역설…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진 세상?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다. 지금 대부분의 온라인 민원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요구한다. 겉보기에는 편리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들, 재외국민, 외국인에게는 높은 벽이다.
실제로 미국 교민인 필자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까지 직접 가야 했다.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한국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이메일 인증 같은 대안도 있었지만, 시스템은 애초에 그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요구하고, 보안상 취약점이 우려되는 팝업 창을 여러 번 띄우는 방식 역시 여전했다. 오랫동안 폐쇄적이라 비판받아온 방식이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최근에서야 재외국민 대상으로 전자여권 인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기존 방식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무엇할까.
결국 이 디지털 민원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시민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는 대신, 시민이 특정 기술에 맞춰야 하는 구조다.
◇ 규정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규정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규정의 존재 이유부터 되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지만, 규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공무원에게도 짐이다. 절차가 늘어날수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둘째, 늘어나는 규정의 전면 공개와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 규정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 쉽다.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 ‘대응했다’는 명분을 쌓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해결하는 척하는 일이 더 간단하다. 정치와 정책에 관심이 적은 시민들은 이런 차이를 잘 모른다.
미국 사례는 분명한 반면교사다. 건국 250년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규정이 꾸준히 늘어왔다. 미국 관보에 실린 규정을 모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지금 약 19만 쪽에 달한다. 필자가 규정의 사회적 비용을 이야기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효율적이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나는 되묻고 싶다. 정부라는 조직은 냉정하게 보자면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인과 자리를 지키려는 공무원이 함께 움직이는 곳이다. 한국 정부만 예외일 수 있을까.
◇ 규정 줄이기, 기술과 데이터로 가능하다
셋째, 데이터와 디자인을 활용해 정부 서비스를 더 나은 ‘서비스’로 바꿔야 한다. 데이터 과학은 시민이 규정 지옥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어떤 규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정책 대상자가 규정의 벽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건 디지털 시대의 공공서비스가 ‘절차를 따르는 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따르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이 절차와 규정을 공부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미국의 시빅 테크(civic tech) 단체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에서 했던 일이며, 필자가 쓴 책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세종서적, 2023)’에서도 강조한 내용이다.
규제는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시민도 규제의 틀 안에 있다. 한국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해답 중 하나는 바로 ‘규정 지옥’을 해소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의 복잡하고 방대한 규정들이 정말 필요한지, 공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규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규정이 많아질수록 부담도 커진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 문제를 국정 과제로 삼았다. 2021년 대통령 명령(EO 14508)을 통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부담을 측정하고 줄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불필요한 규정이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 아니라, 정부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도 시민이 쓸데없는 규정에 시간과 힘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도(正道)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과 부담은 시민이 감당할 몫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규정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김재연 미국의 공공 영역 데이터 과학자
| 필자 소개 학계와 실무를 모두 경험한 미국의 공공 영역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존스홉킨스 SNF 아고라 연구소의 연구교수이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 리더십 센터의 연구위원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의 데이터 과학자로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KDI 정책대학원에서 데이터 과학 담당 교수로 일했고, 공익 목적의 데이터 과학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세종서적 2023)’란 책을 썼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미국 정치학회(APSA)로부터 도시, 지역 정치 부문 최우수 박사학위상(2022), 시민참여 부문 신진학자상(2024)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