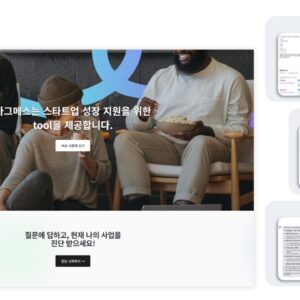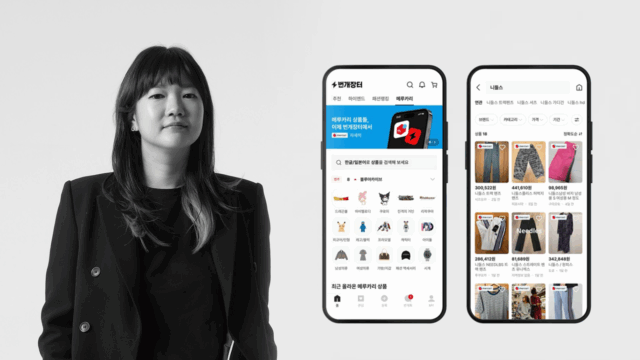[공변이 사는 法] 황필규 변호사
나이 오십줄에 접어든 중년의 변호사는 마치 소년 같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51) 변호사는 “공익 분야는 무한대 시장이라서 할 일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익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공익변호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2005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공감에 합류해 15년을 보냈다. 당시 공감은 연수원 한 기수 선배 4명이 모여 만든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였다. 공익소송 불모지인 한국에서 국제인권, 난민 활동 영역을 개척해 온 그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났다.

◇운명처럼 마주한 ‘난민’, 인생 궤적이 바뀌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난민은 생소한 개념이었죠. 처음 난민 소송을 시작한 2005년만 해도 관련 판결문이 달랑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황필규 변호사의 첫 공익 소송은 난민 사건이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9명의 활동가를 운명처럼 만났다. 난민 신청을 한 건 2000년. 정부는 5년이 지나서야 심사를 시작해 불허 결정을 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2006년 1심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을 받아낸 건 2008년이다. 변호사가 대리한 난민 사건에서 승소한 첫 사례였다.
이후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여론도 집중됐다. 덩달아 그도 바빠졌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의 숨은 공로자도 황 변호사다.
“지난해 예멘 난민 이슈로 한 차례 시끄러웠죠. 난민 활동은 그저 난민을 많이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모두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논란되니까 일각에서는 ‘잠시 피하고 가자’고 하는데 이주민과 난민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소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구금될 수 있는 사회…인권 감수성 높여야
황필규 변호사는 유독 ‘구금(拘禁)’에 관심이 많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처분이 구금인데요. 남 일 같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요.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를 떠올려보세요. 당시 정부는 ‘공중보건’이라는 이름으로 2만명을 자택에 격리했죠. 대부분 증상이 없는 접촉자들인데, 어떤 절차나 규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범죄자 취급한 거죠.”
그는 구금에 대해 “누구도 대비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목소리가 없는 쪽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영사접견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절도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됐는데, 자국의 영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11일이나 구금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상호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충분히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공익변호사는 현장에서 출발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한다. 황 변호사는 “소송만 하는 건 아니고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사건에서 서로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인권보호가 가장 중요하죠. 사건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런데 개별적인 사례를 풀어가는 것만큼 법제도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일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적은 인원이고 우리가 24시간 일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 아닐까요?”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