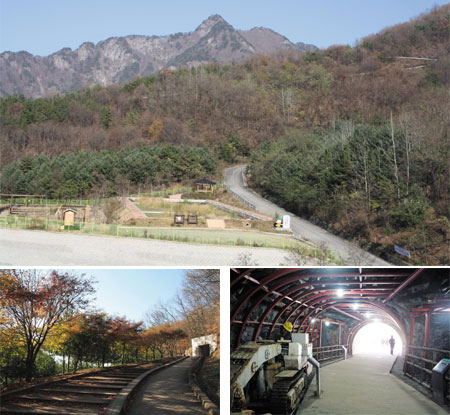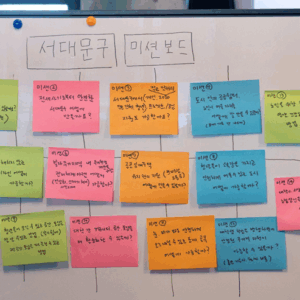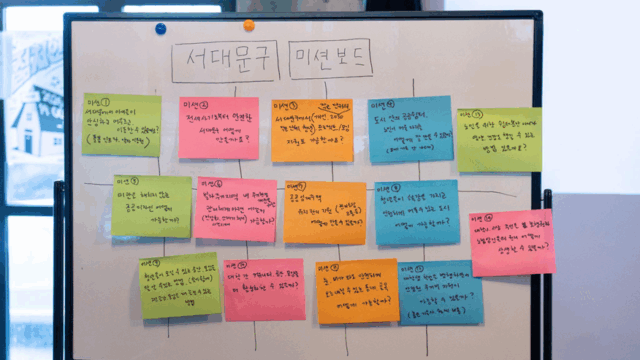진정한 복지 몰라 ‘답답’… 생생한 현장 소리에 속이 뻥~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을 해도 우리 기업들은 꼭 얼굴에 티가 나는 걸 하고 싶어합니다. 얼굴색이 우리와 비슷하면 안 되죠.(웃음)”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회사에서 자꾸 성과 보고하라고 하지요? ‘언론에 확 뜰 만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없을까’ 고민하시죠?” 학생들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지난 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교육’ 심화과정의 모습이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첫 강의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아동·청소년 사회공헌 추진현황과 트렌드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강의를 맡은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공헌은 경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자꾸 1년 만에 성과를 보려고 하고 ‘튀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며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공헌 요소를 찾고 싶다면 탈(脫)시설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규모인 곳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 “열공 중” 기업마다 사회공헌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요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열공 중’이다. 사회공헌 전담 부서가 생겨난 지 2~3년이 채 안 됐고, 그나마 홍보팀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非)전문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더나은미래’가 국내 30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문교육’과 ‘담당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노하우’에 대한 욕구(9명)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창희 코오롱 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가 어렵고, 파트너 기관인 NGO에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