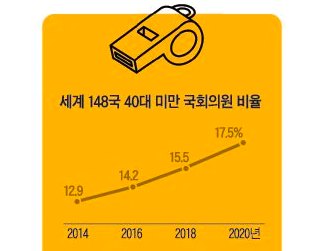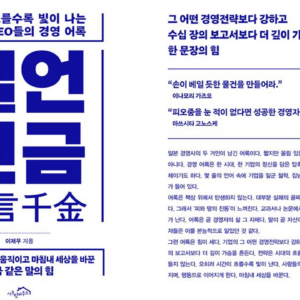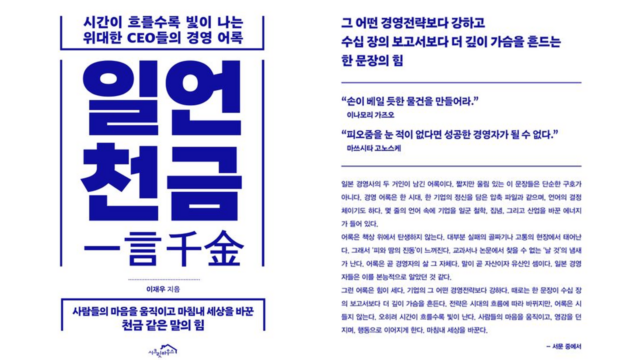미국 콜로라도주(州) 덴버의 북동 지역으로 가면 대평원이 펼쳐진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구조된 야생동물들이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생추어리(Sanctuary)’가 마련돼 있다. 곰, 사자, 표범, 퓨마, 늑대 등 650마리 이상이 뛰노는 곳이다. 규모는 319ha(319만㎡)로 여의도 면적(290ha)보다 넓다. 지난 14일 강원 동해시에서 구조한 사육곰 22마리의 새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美 TWAS, 40년간 이어온 야생동물의 마지막 쉼터 동물보호단체 야생동물생추어리(TWAS·The Wild Animal Sanctuary)는 이곳을 비롯해 콜로라도 스프링필드(3918ha), 텍사스 보이드(16ha) 등 총 3곳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전체 생추어리의 총 부지 면적은 4253ha에 이른다. TWAS는 1980년대부터 40년 넘게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불법 사육 농가에서 압수한 야생동물이 많다. 또 서커스단이나 동물원이 없어지면서 갈 곳 없이 방치된 동물도 데려온다. 평생을 억압된 채 생활한 탓에 자연 생태계로 되돌아가긴 어려운 개체들이다. TWAS 생추어리는 야생동물 종별로 지역이 구분돼 있다. 자연환경도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게 조성했다. 이번 동해시 사육곰이 이주한 콜로라도 생추어리는 물과 나무가 많은 곳이다. 사육곰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생추어리 생활을 시작한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현재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추진 중인 사육곰 생추어리가 완공되면 농장으로부터 구조된 사육곰을 국외로 멀리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부가 부지 제공하고 NGO가 비용 마련 중국·베트남·라오스에도 사육곰 생추어리가 있다. 이미 2000년대에 완공됐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애니멀스아시아(Animals Asia Foundation)는 1998년 중국 청두에 최초로 곰 보호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11개의 곰사와 15개의 방사장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