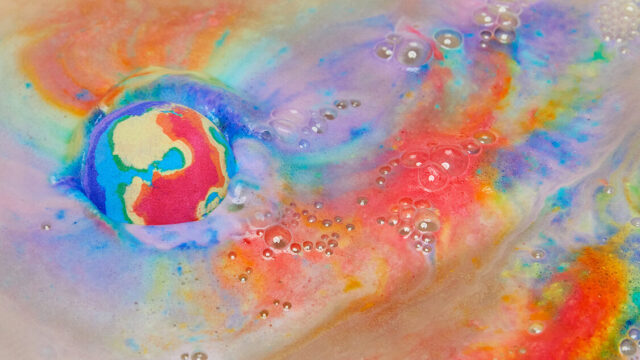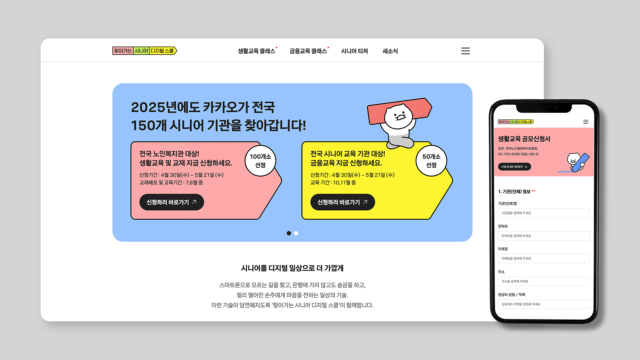네덜란드 노매즈 학교
한동안 외국 경영대학원(MBA)은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외국대학의 경영학 석사학위만 있으면 컨설팅 회사나 투자 회사에 취직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학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1000만원씩 쓴다는 소식도 들렸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경영학도를 양성하는 학교가 등장해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991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는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키우기 위한 카오스필로츠(KaosPilots)가 생겼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 분야를 접목한 스웨덴의 하이퍼아일랜드(Hyperisland), 남아공의 베가스쿨(Vegaschool) 등이 생겼다. 이 학교 중 가장 최근에 세워진 네덜란드 노매즈(Knowmads) 학교가 창의성을 주제로 열린 2010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 초청받아 한국을 찾았다.
“우리 교육의 목적은 보고서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매즈 학교의 교장 피터 스핀더(Pieter Spinderㆍ43)씨는 창의적 기업가 양성에 관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 첫날에 노매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7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14명의 노매즈 학생들은 그가 따온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다.

스핀더씨는 얼마 전 수행했던 네덜란드항공(KLM)의 경영 전략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회사 임원들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의 결과물보다 노매즈의 것에 더 만족해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의 이유로 그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와 거기서 만들어진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꼽았다.
실제로 8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 기간 내내 참여자들은 특별한 교재나 교수법 없이 그들이 가져온 여러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고민을 해결해 나갔다. 충남대학교 박세상(25)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운동을 수업 주제로 삼았다. 박씨는 “특별한 학교 문화, 지역 문화가 없고 학교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떠나가는 게 안타까워 지역상권활성화 운동을 시작했다”며 “어떻게 이 운동을 수익창출과 연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는데 이번 수업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비즈니스에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박씨와 조원들은 이 프로젝트의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을 자르고 붙이며 ‘미래시간표’를 만들었다.
노매즈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이다. 이번 2월 입학한 노매즈 학교의 유일한 한국 학생 구슬(25)씨는 “비록 12명의 학생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흡수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이 다양성을 조합했을 때 신기하고 엉뚱한 것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노매즈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즐기며 서로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피터 스핀더씨는 “기업들이 점점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하고나 일할 수 있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 “설립자가 어떤 에너지와 신념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노매즈를 무엇인가 배우는 곳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기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노매드에 와서 비법을 전수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