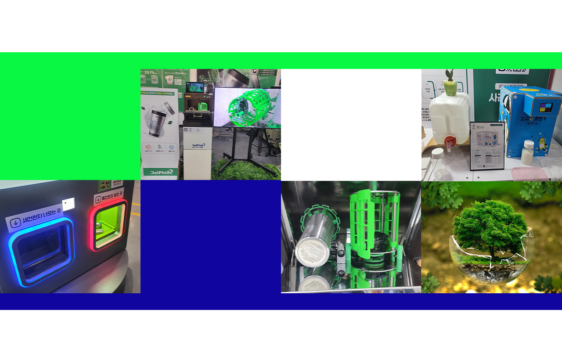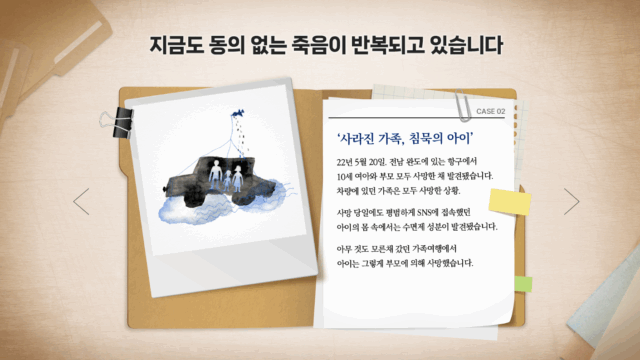‘리필 스테이션’ 활성화 막는 장벽들
개인 용기에 제품 덜어서 파는 가게 늘지만
현행법상 자격증 소지자만 세정용 제품 판매
소분 판매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지 의문

“혹시 샴푸 리필할 수 있나요?”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숍 ‘허그어웨일’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최근 자주 하는 질문이다. 김민수 허그어웨일 대표는 “샴푸나 화장품을 리필할 수 있는지 묻는 손님들이 많지만 매번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샴푸를 덜어서 팔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제로웨이스트숍은 플라스틱 포장재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한 제품만 판매하는 가게다. 2016년 서울 성수동에 생긴 ‘더피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90곳이 넘는 제로웨이스트숍이 운영되고 있다. 고체 비누, 고체 치약 등 친환경 제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곡물과 차, 세제 등을 고객이 가져온 그릇이나 병에 덜어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 코너가 마련된 곳도 있다.
허그어웨일도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섬유유연제 등 세탁 제품만 리필해주고 샴푸와 보디워시 같은 세정용 제품은 리필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세정용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해 개인 용기에 덜어서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 소지자가 가게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세정용 제품을 리필할 수 있는 가게는 10곳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세정용 제품을 리필하기에는 영세한 곳이 많고, 대표가 직접 자격증을 따기에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3월 시행된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응시자 4353명 가운데 314명이 합격해 7.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회 시험 합격률도 10.1%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처음부터 일반인들은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표도 지난 3월 자격증 시험을 치렀지만 떨어졌다. 그는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는 지인 중에 붙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화장품 기업 직원 중에서도 연구원들만 붙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벌크 샴푸를 가져다가 단순히 소분해 팔고 싶어하는 가게 대표들에겐 자격증 시험이 너무 큰 장벽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리필 스테이션이 활성화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화장품을 나눠서 파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자격이나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유해성이나 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 화장품산업협회(CTPA)의 홈페이지에는 리필 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해 ‘위생,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라벨링 등 기존 화장품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리필 등 소분 판매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나와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문제 때문에 규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용량 제품을 개봉하고 나눠 담는 과정에서 변질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샴푸 소분 판매가 자격증을 따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는 “자격증 없이도 활발히 운영하는 해외 리필 스테이션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샴푸나 보디워시 같은 세정용 제품은 유통기한도 길고 변질 우려도 크지 않아 필수적인 위생 교육과 소독, 관리, 필수 표기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리필 스테이션을 확대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