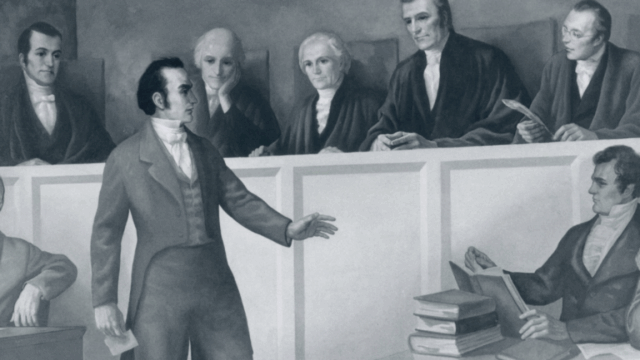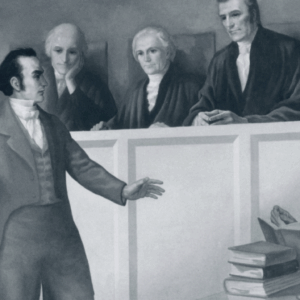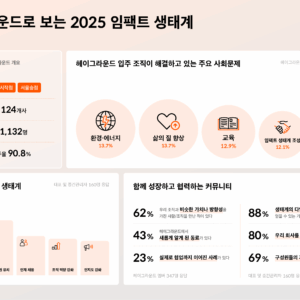드디어 한국에서도 기부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 제도와 담론의 언어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개인 명의의 재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독지가나 기업가가 자신의 자산을 출연해 장학재단 등을 세운 전통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을 재단 명칭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행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유교적 정서, 개인의 이름을 공공선과 직접 연결할 때 생기는 거리감이 한데 얽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주최한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과 미국 레거시 재단(legacy foundation) 사례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재단과 개인재단, 특히 기업가가 설립한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두고 “무엇을 닮고 무엇을 달리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맹목적인 벤치마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단의 ‘규모’나 ‘성공 사례’를 먼저 가져오면, 정작 그 재단이 성립한 토대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식 사적 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가 어떤 역사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미국 모델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재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비영리 섹터의 규모와 범위를 미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을 때, 개념적·제도적 비교가 가장 어려웠던 조직 유형이 ‘재단(財團)’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재단’이라는 이름을 단 비영리 조직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지배구조와 규율 체계도 제각각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재단(foundation)과 한국에서 통칭되는 ‘재단’을 1:1로 대응시켜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분석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의 ‘재단’이 형성된 역사적 경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단’이라는 조직 형태는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 민법상의 재단법인(財團法人) 개념이 유입되며 제도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후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장학재단·교육재단·의료재단·기업재단 등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 조직이 ‘재단’이라는 이름 아래 확산되며 독자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에 해방 이후 미국식 자선 재단 모델과 기부 담론이 덧붙으며, 일본식 행정 보완적 공익 수행 성격과 미국식 필란트로피 논리가 혼합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재단은 어느 한 제도를 단순 복제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적 전통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 재단을 그대로 들여오면, 한국은 ‘재단의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재단 용어의 혼돈’을 다시 여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재단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미국은 봉건제(feudal system)와 군주제(monarchy)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이 역사적 조건이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 만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자발적 결사 조직(voluntary associations)과 사적 지역사회 조직(private community organizations)이 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로 작동해 왔으며, 교육·복지·의료·문화와 같은 사회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치안과 안전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많은 자선 조직(charity organizations)과 사적 단체(private organizations)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비영리 섹터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왔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한국처럼 군주제와 위계적 신분 질서가 장기간 유지된 사회에서는 국가(또는 군주)가 전통적으로 사회 기능의 핵심 주체로 자리해 왔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가 독립된 영역으로 등장하고 제도화되는 과정 역시 미국의 경우에 비해 훨씬 늦게 재개되었습니다.
국제비교를 할 때 ‘봉건제·군주제 경험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역사 취향이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커졌는지, 즉 “국가의 몫을 어디까지 민간이 떠받쳤는지”가 국가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인물이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입니다. 토크빌은 1831년부터 약 1년간 미국을 여행한 뒤 책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미국 사회의 특징을 ‘결사적 삶(associational life)’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에 미국은 ‘군주제도, 봉건제도, 국교도, 특권 계층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독특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은 곧바로 시민사회의 작동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이라면 국가가 제공했을 법한 기능들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단체, 교육기관, 상호부조 단체(mutual aid organizations)들이 곳곳에서 등장했고, 자선(charity)과 자원봉사(volunteer)는 사회를 운영하는 일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자발적 자선 활동은 ‘타인을 돕기 위한 마음’만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Colonial America) 미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역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주 정부는 주로 영국의 법과 명령을 집행하고, 국방·체제 안정·세금 정책·기반시설·지역 행정 관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인정과 서부 영토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그 외의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 영역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비워둔 자리를 시민의 결사와 자선이 메우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요컨대 미국의 사적 재단은 ‘부자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봉건과 군주제를 거치지 않은 사회가 자발적 결사를 통해 공공의 빈틈을 메우고, 그 자발성이 시간이 흐르며 더 정교한 공익 장치로 진화해 온 결과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참고하려면, 재단을 ‘조직 형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자라난 토양,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배분, 자선의 문화, 비영리 섹터가 확장된 방식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나야 비로소 ‘한국형 개인재단’이라는 논의가 개념적 혼란이 아니라 생산적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
필자 소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및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비영리조직, 시민사회, 자선·기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문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경영(Nonprofit management), 비영리 교육과 필란트로피(Philanthropy studies)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와 교육뿐 아니라, 학문적 지식을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 조직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