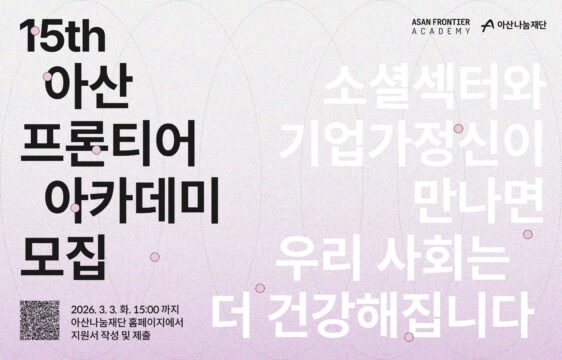한국에서 동물복지 양돈은 여전히 낯설다. 국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농장은 26곳,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생산자는 “기준이 높고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하고, 소비자는 “좋지만 비싸고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수요와 공급은 엇갈린다. 2025년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소비패턴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동물복지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고 답했지만, 실제 구매 경험이 있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모소리(모두를 위한 축산, 모두를 위한 소비)’는 이 정체의 원인을 공공급식에서 찾고자 했다. ‘한 끼로 구조를 바꾼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가 실제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모소리팀이 탐방지로 선택한 곳은 네덜란드와 독일이었다. 두 나라는 동물복지 축산과 공공급식을 제도·시장·소비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온 국가다.
◇ “돼지가 돼지답게 살아도, 농장은 지속됩니다”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오버레이설(Overijssel) 주 헤이노(Heino)에 위치한 양돈 농장 니쉬케스 에르프(Nieske’s erf)를 찾았다.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이 농장은 전통적인 네덜란드 농촌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내가 떠올리던 기존의 양돈 농장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돼지들이 좁은 칸막이 대신 흙바닥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햇빛이 드는 외부 공간에서 몸을 비비고, 꼬리를 흔들며 흙을 파는 모습은 한국의 양돈 농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항생제 사용은 적었고 폐사율도 낮았다. ‘동물복지’라는 말이 붙기 전, 돼지가 본래 하던 행동 그대로였다. 이 농장에서 확인한 것은, 동물복지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라는 사실이었다.
농장주 니쉬케(Nieske)는 “소득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운영은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환 과정에서 시설 개선 비용은 늘었지만, 돼지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폐사율이 낮아졌고 전염병 발생도 거의 없었다. 항생제 사용이 줄자 관리 부담도 함께 감소했다. 그는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 전환이 감내해야 할 손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네덜란드 와게닝엔 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의 로버트 호스테(Robert Hoste) 교수는 “동물복지와 생산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모돈 생산성은 연간 31두로 한국(21두)보다 높고, 폐사율은 4~5%로 한국(약 10%)의 절반 수준이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복지 기준 준수가 높은 생존율과 생산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인증 제도의 구조도 달랐다. 한국에서는 동물복지 인증 기준이 높고 절차가 복잡해 농가 확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네덜란드의 동물복지 인증은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출발해 지금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준은 고정돼 있지 않고, 시장과 농가가 함께 조정해 왔다. 제도의 목적이 ‘선별’이 아니라 ‘확산’에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소비가 기준을 만든다, 베터레벤(Beter Leven) 인증제
네덜란드와 독일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별 표시가 붙어 있었다. 민간 인증제 ‘베터레벤(Beter Leven, The Better Life label)’이다. 별 1·2·3개로 사육 환경 수준을 구분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베터레벤(Beter Leven) 관계자인 마레이케 더 용(Marijke de Jong)과 젬마 빌렘센(Gemma Willemsen)은 “네덜란드 양돈 농가의 약 25%가 별 1개 인증을 받고 있으며, 별 2개는 그보다 적고, 별 3개는 약 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6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더 나은 사육 환경을 경험했다. 동물복지 인증 양돈 농가 비율이 0.4% 수준에 머무는 한국과는 분명한 대비를 이뤘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 신뢰였다. 정부가 규제로 밀어붙인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다시 농가 전환을 이끌었다. 소비가 제도를 움직인 셈이다.
◇ 공공급식이 바꾸는 ‘식탁’의 미래는
독일 베를린의 ‘미래의 식탁(Kantine Zukunft)’은 공공 급식 현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친환경 식재료 전환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곳은 동물복지 돼지고기가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급식 체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운영 주체인 슈파이제 로이메(Speiseräume GmbH)는 보육시설, 학교, 병원, 요양시설,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매일 약 7만 끼의 급식을 진단하고, 교육·조리 실습·메뉴 재구성을 통해 전환을 돕는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슈파이제 로이메 대표 디나 호프만(Dinah Hoffmann)은 “프로그램 이후 친환경·동물복지 식재료 사용 비율이 평균 68%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다.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자 잔반은 줄었고, 조리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는 높아졌다. 현장의 데이터는 동물복지 식재료 사용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통념과 달랐다. 메뉴 구성 조정, 채소 비중 확대, 가공식품 축소만으로도 비용 중립적 전환이 가능했다.

이 사례가 보여준 것은 공공급식이 단순한 소비처가 아니라, 농장 전환의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공공급식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를 갖는 영역이다. 이러한 특성은 농가 입장에서 사육 환경 개선과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독일에서도 스트레스와 감염 위험이 낮은 사육 환경이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동물복지 전환이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의 공공급식 시장은 약 21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학교와 대규모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만 9조 원이 넘는다. 만약 지자체가 공공조달 단계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점진적으로 결합하고, 학교·군대·복지시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을 설계한다면, 농업·환경·복지를 잇는 새로운 순환 구조를 실험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동물복지는 점차 축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이 전환을 시장의 자발성에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공급식이라는 구조적 지렛대를 활용할 것인지. 네덜란드와 독일의 현장은, 그 선택이 이미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민경 삶과그린연구소 소장
| 필자 소개 사회복지 경력 23년차로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삶과그린연구소 소장(사회복지학 박사)이다. 사회복지·사회적경제·기후복지·지속가능한 삶을 연결하는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