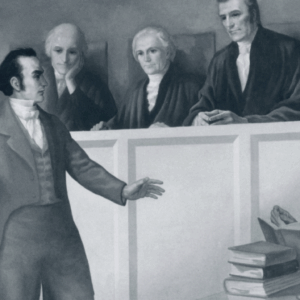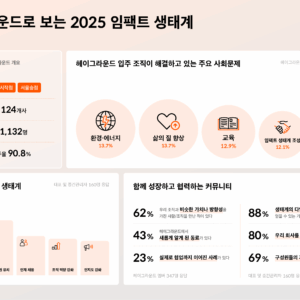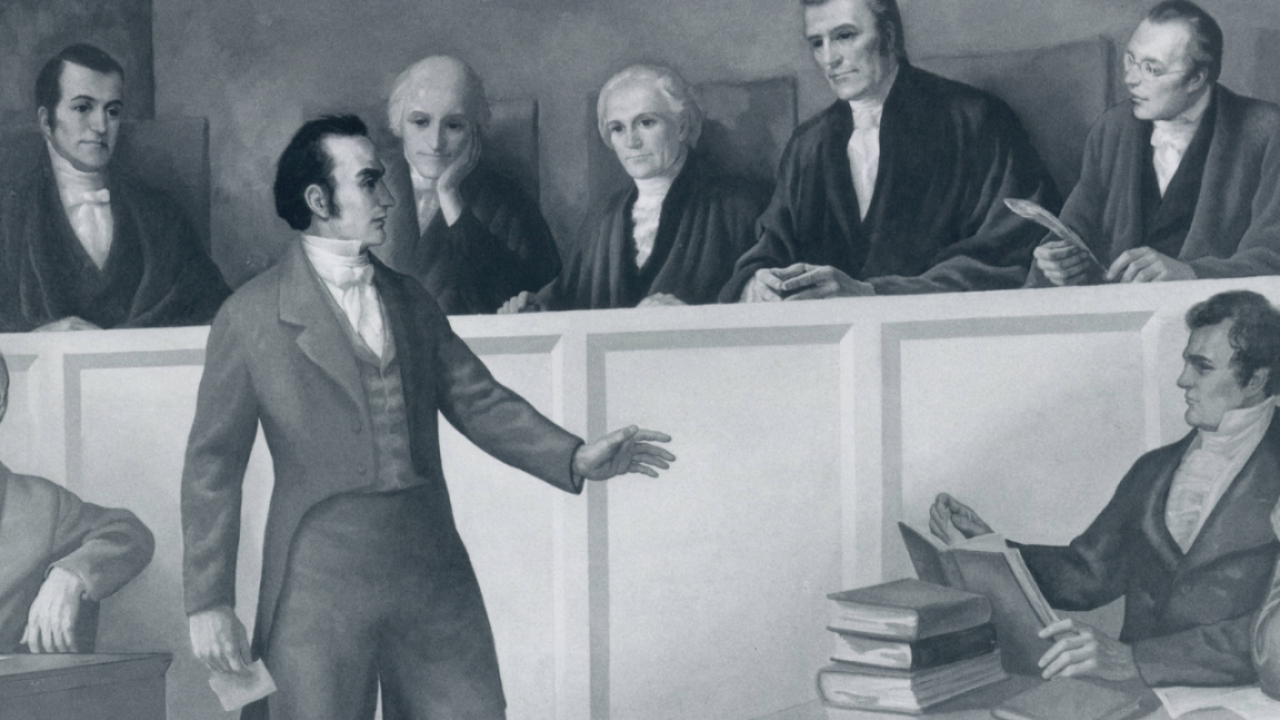
미국의 필란트로피를 떠받친 바닥은 ‘자발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성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굳어지려면, 그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영리 섹터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결국 “민간이 공공의 빈틈을 메워 왔다”는 역사만큼이나 ‘민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함께 답이 됩니다. 그 제도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사건이 1819년 연방대법원 판결,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Dartmouth College vs. Woodward)’입니다. 당시 미국의 자선·교육기관이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주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공익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조직이 곧장 행정의 보완물처럼 다뤄질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한국의 공익법인과 비영리 조직이 자주 부딪히는 ‘행정의 그림자’가, 미국 초기에도 전혀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트머스 사건은 뉴햄프셔 주 정부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을 변경해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측은 주 정부의 조치가 미국 헌법의 계약조항(Contrac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대학 설립 헌장은 공공 목적의 허가장인가, 아니면 사적 계약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이 사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주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한 대학의 지위를 지켜준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적 법인’이 정치권력의 변덕으로부터 보호받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에 방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