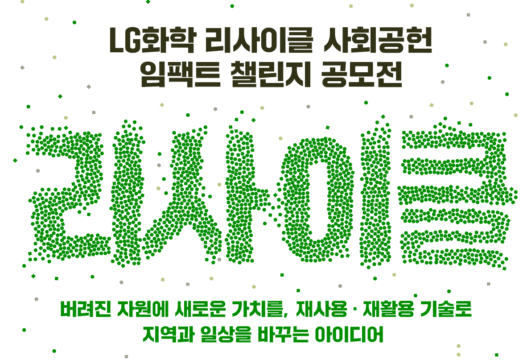고물상 폐지→수집업체서 압축→제지공장서 재생지로 탄생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소비된 종이의 양은 915만t이다. 새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30년생 원목 17그루가 필요하다. 식목일을 맞아 고물상·중간수집업체·제지공장 등의 현장에서 헌 종이를 새 종이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재생용지의 탄생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가봤다.
지난말 29일,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한 고물상. 이곳에서 일한 지 3년 됐다는 김정수(가명·63)씨는 바쁘게 종이를 골라내고 있었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모여든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흰 종이, 신문지, 박스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가 일하는 동네 고물상은 버려진 종이가 몰려드는 첫 번째 장소다. 버려진 종이들은 이곳에서 돈으로 바뀐다.
김씨는 눈과 손을 종이에 고정시킨 채 “종이를 버릴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폐지’로 버려지는 종이 가운데는 코팅된 상태이거나, 스프링 등 이물질이 그대로 달린 채 들어오는 종이가 많아서 몇 번씩 재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도 요즘 들어 폐지를 버리지 않고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예전에는 노인들이나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왔었는데, 요즘엔 근처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차에 폐지를 싣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파트 단지 내의 분리수거함에 종이를 버리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고물상으로 가져오는 거겠죠?”
폐지의 양은 일주일이면 15톤에 이른다. 김씨는 폐지들이 너무 많이 쌓이기 전에 정기적으로 ‘중간수집업체’에 보낸다. 중간수집업체는 고물상이나 아파트, 빌딩 등에서 나오는 종이들을 모아 압축해서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곳이다.

이어서 찾은 시흥시 매화동의 폐지전문수집업체 ㈜평화자원은 15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직원만 35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회사였다. 큰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현장에는 폐지로 만들어진 산이 족히 10개는 넘게 있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안산·인천·서울 등의 고물상·아파트·학교 100여 곳에서 모아온 것들이다. 평화자원의 고영승(44) 대표는 집게차와 불도저 등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폐지산’ 사이를 앞장서서 걸었다. 고씨는 “이곳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폐지 양이 무려 1000여 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15년 넘게 폐지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씨 역시 분리수거의 문제를 지적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15개에 달하는 폐지 종류 중에 3가지 정도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리수거하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스는 박스로, 신문지는 신문지로, 흰 종이는 펄프와 섞여 고급화장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뒤섞이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기껏해야 박스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또 있다.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을 하지만, 폐지가 ‘폐기물’로 분류돼서 공장입지 선정에 제약이 많고 세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씨는 “폐지를 모으는 일은 재활용산업이고 녹색산업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불이익은 안 받게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에 넣어 네모반듯하게 만드는 압축 과정을 거치면 폐지는 종류에 따라 전국 10여 개의 제지공장으로 흩어진다. 전국에 있는 공장 중에서 그나마 가까운 시화공단에 있는 한 공장으로 가보았다. 이곳에선 모인 폐지들이 큰 통에 쏟아져 물과 섞였다. 이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쓰레기들이 걸러져 소각장으로 향했다. 남은 폐지와 물은 곧 죽처럼 변해 재생종이의 원료가 됐다. 폐지와 쓰레기, 계속해서 재활용되는 물이 섞인 공장에는 온통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머리가 아파 왔지만 물에 젖은 원료가 판에 올려져 형태를 갖추고 말려지며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공장을 둘러보고 나오기 직전, 완성된 재생용지가 가득 찬 창고를 지나왔다. 재생용지들이 사람 키의 몇 배에 달하도록 쌓여 있는 그곳은 100년도 더 된 고목들이 모인 숲 같았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김 이사의 말이 강렬하게 와 닿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