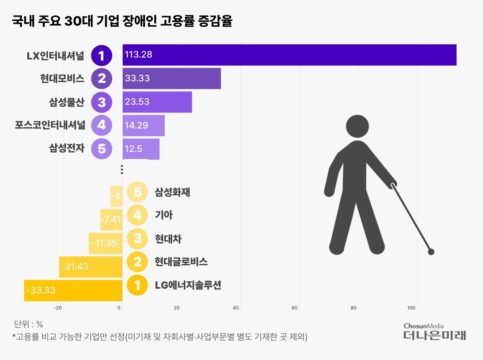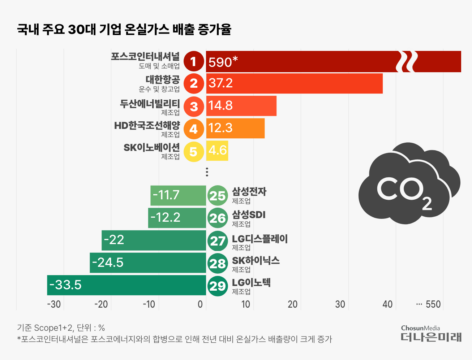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인 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 중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킨 비중이 72.5%였다. 100~299명,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선 36.5%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은 다시 낮아진다”고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000원이었다. 50~299명 기업체는 34만6000원, 300~999명 기업체는 45만8000원, 1000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만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사 비중은 60.6%였다. 생산직 중에는 단순노무직(39.0%)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무직에서는 사무종사자(17.7%), 서비스종사자(10.2%) 비중이 높고 판매종사자(2.2%) 비중은 작았다. 보고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숙련도를 쌓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저자인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무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