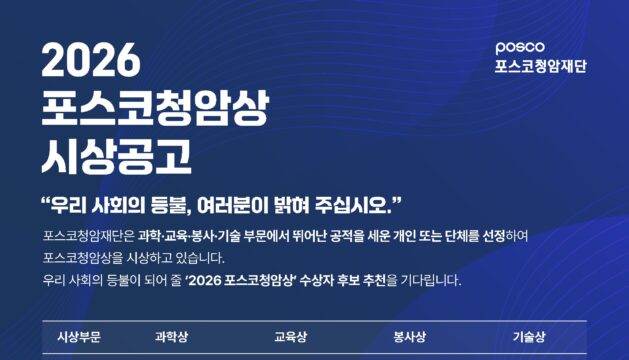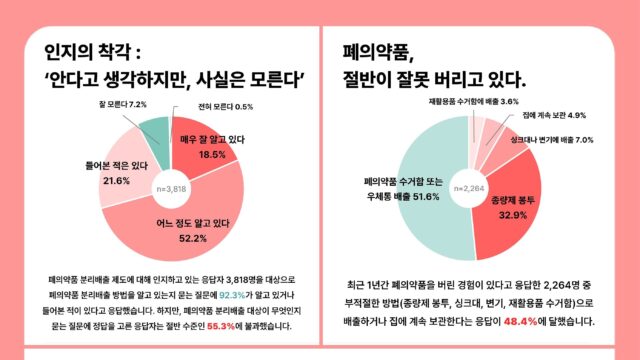기업 대부분이 적자 늪에 ‘허덕’ ‘소재은행’ 있지만 전시장에 불과… 재료 부족해 제품 못 만들기도 公共이 ‘소재 중개 전문가’ 키워야 업사이클 특성상 제품 설명 중요 더 많은 오프라인 판매처 필요해 정부, 청년 창업·지원센터 확대 계획 전문가 “생산 시설 마련이 더 급해” 아름다운가게가 운영하는 업사이클(upcycle· 폐기물에 디자인·기능을 덧입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가 최근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오프라인 매장 디스플레이를 세련된 편집숍처럼 바꾸고, 최신 유행 디자인을 접목한 하위 브랜드 ‘리업(Reup)’도 출시했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이라기보다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이다. 에코파티메아리 관계자는 “사업이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내자 아름다운가게 내부에서 브랜드를 완전히 접어야 한다는 얘기가 진지하게 오갔다”며 “버려진 자원에 새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했다. 2006년 탄생한 에코파티메아리는 명실공히 국내 1호 업사이클 브랜드다. 아름다운가게로 들어온 기부 물품 중 판매하기엔 질이 떨어지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을 재료 삼아 인형, 지갑, 가방, 의류 등을 제작해 판매해왔다. 에코파티메아리 제품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한계에 부닥친 지 오래다. 국내 업사이클 시장이 위태롭다. 2018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사이클 시장 규모는 4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업사이클 기업 ‘프라이탁(Freitag)’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약 700억원)의 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별 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가 2016년 국내 주요 업사이클 기업 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