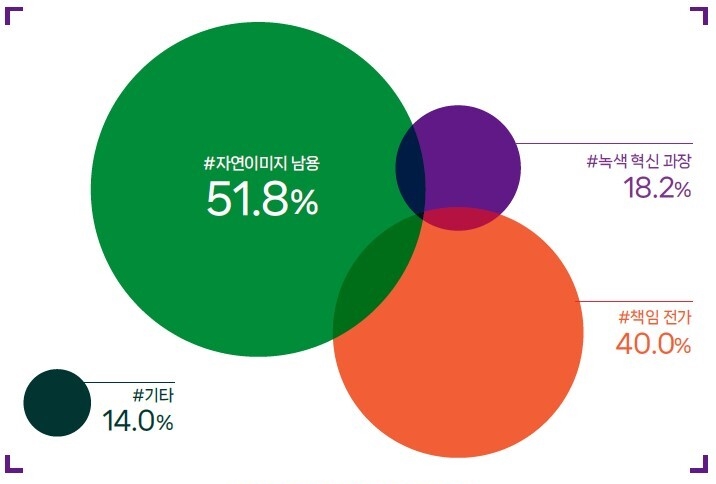더나은미래 ‘CSR 커넥트 포럼’ 개최국내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 일하면서 가장 막막한 지점이 사업의 임팩트 측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지만 해법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과 만나 고민을 나누고, 임팩트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전문가 강연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2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브릭스 성수시작점에서 열린 ‘CSR 커넥트 포럼’에 참석한 김지연 CJ올리브네트웍스 대리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얻을 수 없는 값진 정보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과 기업재단의 CSR 담당자들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킹 목적의 행사지만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를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장을 맡은 신현상 경영학과 교수가 ‘임팩트 측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주제 강연으로 연단에 올랐다. 신 교수는 “조직이 추구하는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측정과 평가 방식, 피드백과 소통 방안 등을 기업 내부에서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임팩트 측정 자체는 무의미하다”며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모두 수치화할 순 없지만, 사회공헌 사업으로 어떤 임팩트가 발생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 ‘임팩트 측정을 잘하는 법’은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매우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전략적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신현상 교수는 “사업을 확장할 때 수혜자의 수를 넓히는 ‘스케일업(Scale-up)’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