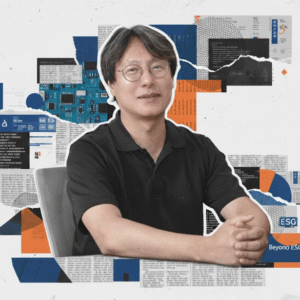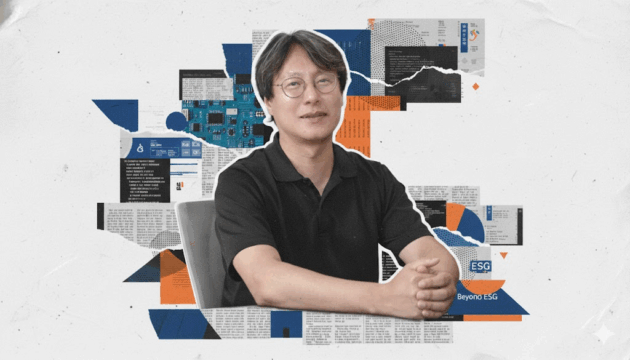후배 남편은 책도 펴낸 셰프다. 나누고 싶다는 뜻을 품더니, 기어이 동료 셰프 20명을 모았나 보다. 나에게 SOS를 청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요리 재료를 사들고 가서 보육원 아이들 맛있는 걸 해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봉사할 보육원 찾기에 나섰다. 수도권인지 지역인지, 보육원 아이들 규모는 몇 명인지, 해당 보육원이 열정이 있는지…. 여기저기 묻고 부탁해서 다행히 연결시켜줬는데, ‘더나은미래’ 편집장으로 지닌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일반 개인이 알아보기엔 참 힘든 구조라고 생각됐다. 지난주에 만난 한 기업 홍보 책임자는 자선 콘서트 때문에 겪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자선 콘서트를 많이, 자주 열어서 나눔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표가 안 팔려 실무자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고생스레 모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홍보조차 도와주지 않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피드백도 아예 없다고 했다. 밖에서 보면 기부나 사회공헌은 참 멋진 일이다. 하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드러내놓고 말 못 할 사연이 참 많다. 기업 사회공헌 기금 중 일부가 준조세요, 민원 해결형 후원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비영리 혹은 복지기관에선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료화로 인해, 실제 원하는 진짜 임팩트를 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눈먼 돈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지금까지는 ‘목적이 좋으니, 과정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어도 참아주자’는 온정주의가 컸다. 최순실 사태는 이 분위기를 바꿀 것 같다. 기업마다 기부금 집행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챙기려 노력한다.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