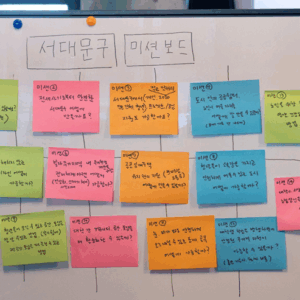6월의 마지막 주, 국제영화제로 잘 알려진 프랑스 칸의 드넓은 해안가에 수많은 미디어, 광고회사들이 모였다.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모래사장 위에 거대한 부스를 세웠고, 낮에는 세미나로 밤에는 네트워킹 파티로 쉴새 없이 열렸다. 지중해의 태양만큼이나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칸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매년 국제광고제 ‘칸 라이언즈(Cannes Lions)’가 개최된다. 규모 면에서나 참가 인원, 예산으로도 영화제를 훨씬 압도하는 큰 행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은 온라인 행사로만 진행됐고, 올해 다시 오프라인 행사를 시작했다.
파울러스는 이번 칸 라이언즈 광고제에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여러 부문에 출품했다. 팬데믹이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글로벌 광고계의 동향도 경험하고 세계인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수상에 있어서는 기대보다 성과가 좋았다.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점자패드 ‘닷패드’의 광고 캠페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알려진 ‘티타늄(Titanium) 상’을 받았고, 독립 광고대행사 이노레드와 함께 진행한 ‘우유안부(Greeting Milk)’ 캠페인 등으로 총 5개의 본상을 받게 됐다. 국내 광고 회사로는 으뜸가는 성적이다.
수상하게 된 ‘닷패드’의 캠페인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유안부’는 독거노인의 건강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활용 캠페인에 더해 일반인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제라고 해서 재미있거나 멋진 연예인을 기용해 대중의 기억에 각인시킨 광고를 발굴하고 시상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적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커뮤니케이터와 브랜드의 사회적 참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로를 인정해온 역사는 벌써 10년이 넘는다.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칸은 이러한 담론과 솔루션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제는 수상작 중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나 ESG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기가 더 어렵다.
헌데 올해는 그러한 기조를 넘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다름 아닌 메타버스, 웹 3.0, 블록체인, NFT 등이다. 관련 세미나가 곳곳에서 열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물론 아직은 기술의 상용화전 단계이기에, 많은 브랜드들이 이 기술을 간단한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는 상황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근 미래에 대해, 많은 기업이 고민하고 나름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목도 할 수 있었다. 과연 어떤 브랜드가 기존 사회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빠르게 만들고 시장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광고제 참여자들에겐 초유의 관심사였다.
올해 초까지 메타버스와 NFT로 사회가 떠들썩하던 시기가 지나고, 팬데믹 기간 발생했던 유동성 버블이 급속히 꺼지자 연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블록체인 기술이 바탕이 된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 오겠는가? 메타버스는 사실 버블이었다! 웹 2.0이 더 편리한데 도대체 NFT를 활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다. 심지어는 웹 3.0의 탈중앙화 정신을 공산당 혁명의 실패에 빗댄 글까지 보기도 했다. 물론 시류를 평가하고, 예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인, 예술가의 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배웠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활용해 세상에 유익을 전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이에 대해 처절한 고민과 토론, 실천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식과 예술의 견지라고 배웠다. 매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토론하고, 또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들의 장. 이것이 내가 광고계를 좋아하고 광고제를 사랑하는 이유다.
김경신 파울러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