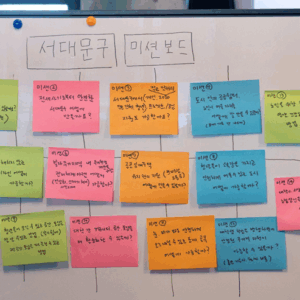줄리아 카심 英왕립예술대학교 헬렌함린센터 수석연구원
노약자·장애인 위한 인클루시브 디자인
아이 건강 체크할 수 있게 검진기구 넣은 곰 인형과
스마트폰에 입바람 불면 폐건강 점검하는 앱 개발
“사람을 포용하는 디자인, 주류사회도 바꿀 수 있죠”

“타자기가 만들어진 배경을 아세요? 세계 최초의 타자기는 1808년 이탈리아 발명가인 펠레그리노 투리가 장님이었던 그의 여자 친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가 글을 쓰는 걸 돕기 위해서였죠. 디자인은 사회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소외된 사람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한 디자인이 다시 주류 사회를 혁신하기도 하죠.”
영국왕립예술대학교(RCA·Royal College of Art) 헬렌함린센터 수석연구원 줄리아 카심<사진>은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2000년대 초부터 이 분야를 개척해 온 세계적인 인클루시브 디자이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기리는 세계적인 대회 ‘디자인 챌린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계 12개 국가에서 진행해왔다.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 세계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하는 디자인 위크스(Design Week’s) 50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노령화사회와 연금에 관한 콘퍼런스로 내한한 줄리아 카심을 만나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해 물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중심에 둔 디자인’이다. 노인이나 장애인같이 기존 주류 디자인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디자인이다. 올해 7월, 영국 셰필드 할렘대학(Sheffield Hallam University)의 ‘보건 디자인’에서 디자인 챌린지(Design Challenge)를 개최했다. 이번 챌린지는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er) 만성병을 앓는 환자들과 가족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미션이었다. 팀 1에 속한 환자인 몰리 가족의 고민은 ‘어떻게 어린 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보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였다. 낭포성 섬유증은 폐를 포함, 여러 신체 부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엄마가 항상 옆에 있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보는 게 중요하다. 이 팀에서는 곰 인형(Our Bear)을 만들었다. 곰인형 배에는 비타민, 항생제, 호흡기 등 몰리가 스스로 상태를 검진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똑같이 만들어 넣었다. 가이드북도 재밌게 만들었다. 어린아이들이 인형 놀이하면서 인형들을 돌보듯, 몰리는 곰 인형을 돌보면서 자기를 돌보는 법을 배우게 한 것이다. 병원에 갈 때마다 곰 인형을 잘 돌봐준 걸 보여주면 의사선생님한테 도장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 그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이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다.”
―디자인을 통한 혁신적인 사회 문제 해결인 셈이다. 또 다른 사례는 없나.
“이번 챌린지에서 팀 2는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청소년을 위해 ‘BlownAways’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아이들이 이걸 깔면, 처음에 핸드폰 시작 화면이 모래로 덮여 있어 ‘후’ 하고 불어 모래를 날려야만 시작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아이폰에 대고 바람을 불면 바람의 정도나 세기 등을 수치화해 컴퓨터 데이터로 전송되도록 했다. 아이들이 6주에 한 번 의사와 만났을 때 의사는 아이의 폐 건강 정도를 시각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자율성을 누리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
“1970년대 말부터 약 20여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예술 칼럼을 기고하는 일을 했다. 1980년대는 일본이 한창 경제 호황기를 누릴 때였다. 일본 정부는 매우 많은 돈을 미술관과 박물관을 세우는 데 투자했다. 그곳에서 나는 재미있는 작업을 했다.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전시를 디자인하고 큐레이팅한 것. 1994년에 처음으로 전시를 열었는데, 종이 카탈로그 대신 오디오 카탈로그를 만들어 녹음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자 한 것. 오디오는 작품 연혁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아주 상세히 묘사했다. 만질 수 있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섞기도 했다. 이 전시는 나한테 엄청난 경험이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 계기다.”
―한국에서는 아직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품에 한정되는 게 크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란 개념이 낯선 한국에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누구나 주류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 딸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다. 많은 정책, 제품들, 서비스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 내리기만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하고 싶지 않은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누구든 언제까지 주류일 수는 없다. 나이가 들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 단순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연금제도를 개편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삶을 디자인하는 ‘디자인의 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