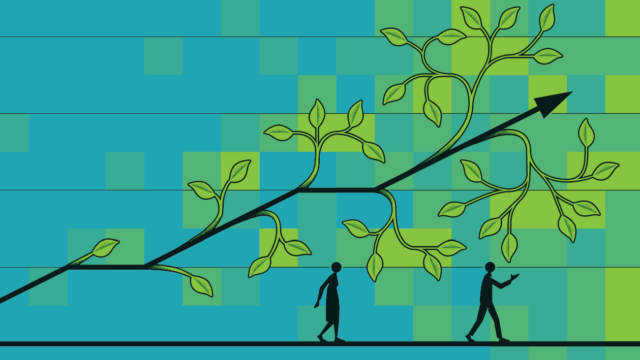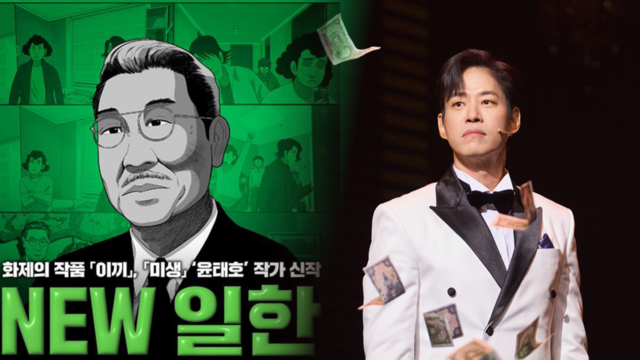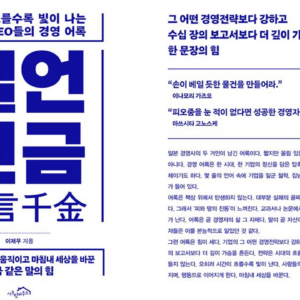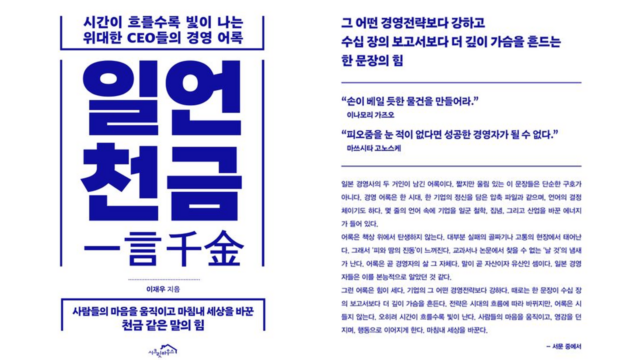ESG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급망 규제’
EU 주도 ESG 규제 강화…국내 기업 대응 부족해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9층짜리 의류 공장이 붕괴해 1129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라나 플라자’ 사건이다. 이 사고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낙후된 공장에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0개 이상의 글로벌 의류업체가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 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화재 및 공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공급망 관리’는 ESG 경영에서 다시 주요한 화두가 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7월 ‘기후 및 탈탄소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에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ESG 규제의 3가지 층위…국내법, 국제법, 연성규범
지난 7일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개최한 ‘ESG 컨퍼런스’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경영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외 다양한 ESG 규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ESG 규제는 ▲국내 법령 ▲국제 규범·외국 법령 ▲기타 연성규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진다. 먼저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에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며, 이는 최근 들어 강화되는 추세다.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는 EU의 CSRD(ESRS)·CSDDD·CBAM, 독일의 공급망실사법, 프랑스의 기업인권실사법 등이 해당한다. 윤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왜 유럽의 법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해외 고객사와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국내 기업은 이들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연성규범’에는 UN, OECD 등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과 GRI, ISSB 등 공시 기준이 포함된다. 이 규범들은 자율적 규제였지만 점점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다. 고객사와 소비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의 요청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 EU의 ESG 규제, 연성규범에서 법제화로 진화중
특히 EU는 ‘지속가능성 법제화’를 선도하는 등 ESG 규제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 OECD가 1976년 발표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2011년 UN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이 흐름 속에서 EU는 2014년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Non-Finacial Reporting Directive·이하 NFRD)을 법제화했고, 2018년 지속가능금융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ESG 규제의 체계를 강화했다.
EU는 지난해 NFRD를 보완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시행하며, 기업들에게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와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문제를 관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EU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개별 법령들이 이에 맞춰 정교하게 채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205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U의 CSRD, CSDDD 등 주요 ESG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에 불과했다. 특히 81.4%의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의 ESG 규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산업계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