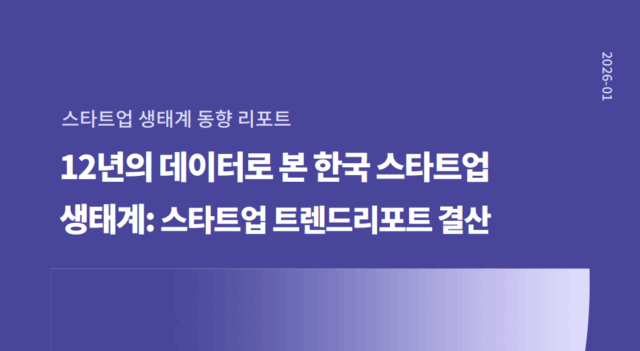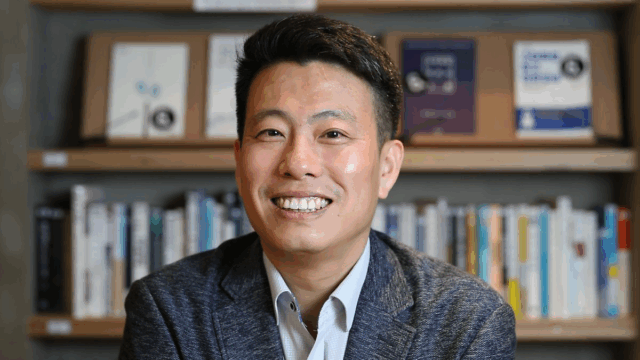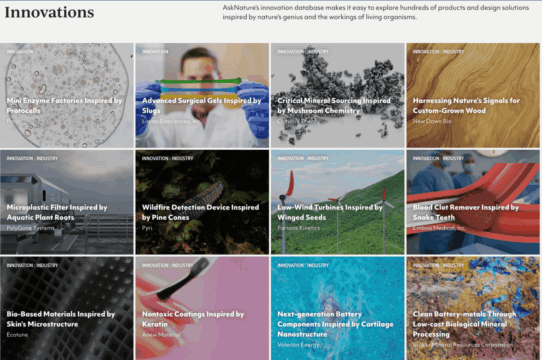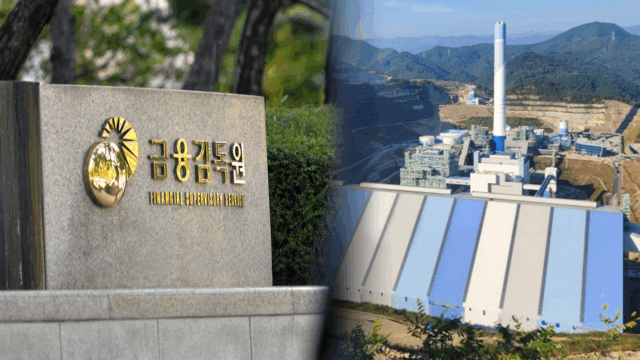지난해 6월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역의 후보자들이 ‘청년 창업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까. 과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으로 대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지금은 이런 공약이 먹히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 때문에 지방에 있던 공장이 폐쇄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 현실 인식이 부족한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이 정도는 이미 학습됐다. 그다음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공약이 유행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지방산업단지 중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역시 이미 학습이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가 청년 창업 육성이 됐다.
이 카드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이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스타트업이 됐다. 문제는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거나 스타트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9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수도권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익숙해진 창업가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끌어내린다는 말인가. 해법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는 서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 최초의 창업 붐이 일었을 때부터 스타트업은 투자사들이 자리 잡은 강남 테헤란로에 몰려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수의 스타트업이 성수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핫플레이스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MZ세대 창업가들은 놀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창업도 한다. 둘째, 창업가들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주도권이 투자자에서 창업가로 이동한 것이다. 어디에 자리를 잡든 투자자들이 찾아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은 제주, 부산,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연결성이 좋다는 점이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스타트업은 끊임없이 교류하기 때문에 연결성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서울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모이고, 지방에서는 공항과 KTX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모인다. 그다음은 놀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싶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난 셈이다. 예를 들어 전주가 그렇다. KTX역이 있고 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이 있다. 반면 청주나 충주는 지역에 좋은 콘텐츠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생태계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청주 인근의 오송은 KTX역이 있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송에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들만 자리 잡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창업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스타트업을 지역에 유치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업지원금이나 투자금을 주겠다고 유혹하기 이전에 먼저 라이프스타일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 지역에 만들어진 적지 않은 창업지원센터 내 공간마다 회사 간판은 붙어있지만 사무실은 텅텅 비어있다. 지원금을 받고 투자받기 위해 주소는 지방에 두지만 정작 그 지역에서 일하지 않고 고용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역에서 일하게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게 재밌어야 한다. 먼저 놀기 좋고 살기 좋은 라이프스타일 도시를 만들어야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양경준 크립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