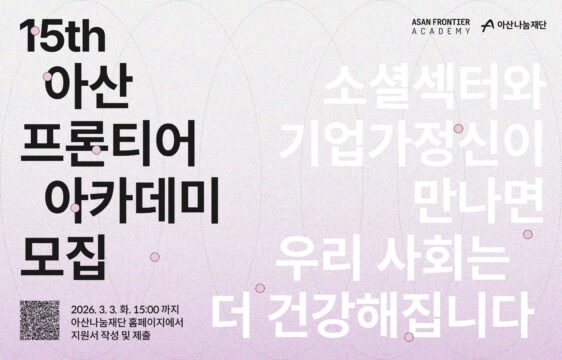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신고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은 신고자 개인이 아닌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접수·조사 등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가 이뤄지며, 보호조치 신청도 보다 수월해진다. 공익신고 이후의 보호·보상이 개인의 선택이나 인지 여부에 맡겨지는 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신고 이후 보호도 보상도 없다면, 아무도 그 비상벨을 누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