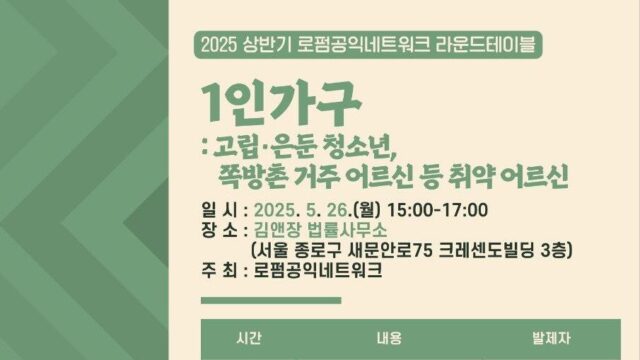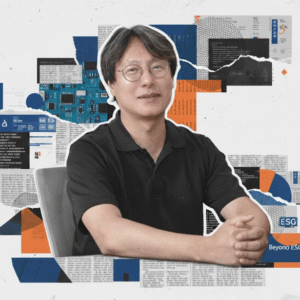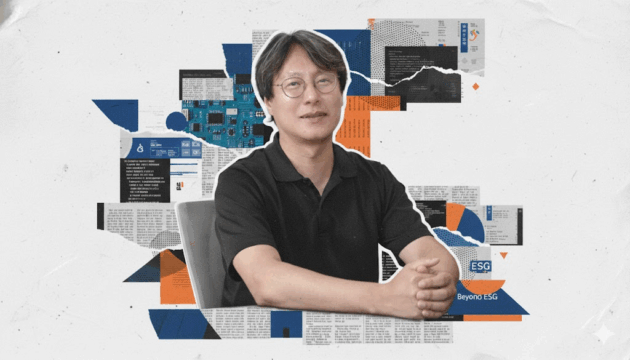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의 무연고자 장례 자원봉사를 가다

지난 8월 21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두 사람의 장례식이 열렸다. 간소한 제물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국화를 놓는 장면은 여느 장례식과 같았다. 다만 장례를 치르는 이들이 고인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점이 달랐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기리는 무연고 장례식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기자는 이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모르는 이의 상주를 맡아 위패를 모셨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공영 장례를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이 봉사자들을 맞이했다.
가족이 아니라도 할 수 있게 된 ‘마지막 인사’
이날 공영 장례식장에는 봉사자 3명과 나눔과나눔 활동가 2명이 함께했다. 기자는 고인의 위패를 들고 화장 절차를 지켜봤다. 영정사진 없이 위패만 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이사는 “이런 장례조차 최근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뿌리깊은 가족주의 장례문화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률상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주관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신·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침을 바꾸면서 친족이 아닌 사실혼 관계나 친구·이웃 등 생전 고인을 돌본 이들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인과 가까이 지냈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서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런 변화를 반겼다. 하지만 법률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권한은 고인의 사후에야 인정되기 때문에 장례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후 신청서를 내고 절차를 밟다 보니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얼마 전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삼촌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분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상담자가 있었어요. 삼촌은 의사가 장례를 준비할 것을 권고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였으며, 호적 관계상 가족도 없었죠.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삼촌이 아직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조카가 낸 장례주관자 지정신청서를 거부했어요. 사후에 신청서를 받게 돼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상담자는 삼촌이 돌아가시고야 신청서를 제출했고, 장례도 뒤늦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무연고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회
이날 기자가 참석한 무연고 장례식에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잠깐 추모를 해도 괜찮을까요?” 시민은 술을 따르고 큰절을 올린 뒤 묵념했다. 나눔과나눔 활동가 김민석 씨는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공영 장례식이란 팻말을 보고 들어와 추모해준다”며 “공영 장례 신청 자격이나 전국적으로 공영장례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누구나 무연고자의 죽음에 대해 추모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나눔과나눔의 목표기도 하다. 박 이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죽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무연고 죽음을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사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인의 시신을 정부에 위임하고 공영장례를 치르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거둬야 한다고 했다.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남은 음식을 쪽방촌 주민들에게 가져다 드린다. 박 이사는 “나눔과나눔은 쪽방촌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쪽방촌 주민들 대부분이 홀로 죽음을 맞기 때문”이라고 했다. 쪽방촌 주민들도 무연고 장례식을 자주 찾아와 조문한다.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은 “무연고 죽음은 쪽방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라고 했다.
이날 장례에 모인 이들은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내며 하고 싶은 말을 카드에 작성했다. 장례식장 뒤편엔 봉사자들이 남긴 여러 장의 카드가 걸려 있었다. 카드를 하나씩 읽다 보니 봉사자 중 한명이 낭독한 조사(조문의 글)한 구절이 떠올랐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혼자인 무연고 사망자의 외로움을 바라봅니다.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는 죽음마저 걱정이 돼버린 우리네 삶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당신을 배웅할 수 있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짧은 인연이지만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강태연 청년기자(청세담1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