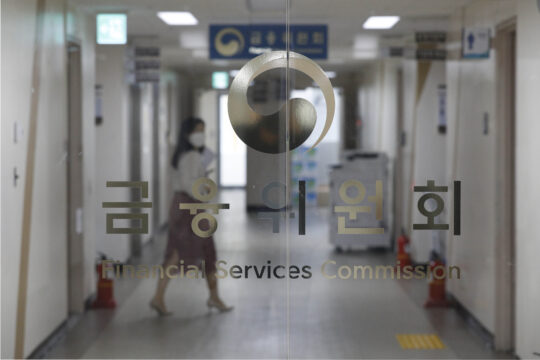최근 대기업 소유 및 관련 공익재단(이하 기업재단)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세청이 기업재단을 향한 칼날을 뽑아 들었기 때문. 지난해 11월 5대 그룹 CEO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전수조사에 돌입, 오는 3월까지 51개 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까지 꾸려 엄중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가 공격 대상이었다면, 이젠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대기업 및 관계사와 오너가 출자한 자산액 상위 20개 공익재단의 임팩트(사회문제 해결) 및 투명성을 분석했다.
◇기업재단 자산 9조원…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해결에 87%

삼성·현대·LG·두산 등 주요 그룹 및 오너가 출연한 공익재단 상위 20곳의 총자산은 약 9조3571억원(2016년 국세청 공시 기준). 2018년 정부가 책정한 환경(6조9000억원), 문화·체육(6조5000억원), 외교·통일(4조7000억원) 총예산보다 큰 규모다.
더나은미래가 자산액 상위 20개 기업재단의 주요 사업 60건(재단별 예산 지출액 상위 3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87%(52건)가 ‘교육 불평등(43.5%)’ 및 ‘삶의 질 저하(43.5%)’ 문제 해결에 치중돼 있었다. 청년 취업·일자리 창출 등 ‘노동 불안정’ 해소를 위한 사업은 1건, 환경 관련 사업은 0건이었다. 특히 노인 소외, 정서 불안, 부족한 복지, 질 낮은 보육, 문화 격차 등을 포괄하는 ‘삶의 질 저하’ 문제 중에선 ‘문화 격차 해소(65%)’를 위한 사업과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35%)’ 지원이 전부였다. 정부 부처를 움직일 만한 기업재단의 자산이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편중돼 있는 것.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체 사업의 65%가 생계비 및 교육비(장학금)·문화예술 체험·연구비 등 수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단순 사업에 그쳤고, 전문성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내 기업 재단들이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프로그램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있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키우는 일 또한 재단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 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미국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재단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재단 관계자들은 어떤 단체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직접 현장을 찾고 수혜자 인터뷰를 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단을 찾아다닌다.

대표 우수 사례가 미국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재단이다. 재단은 NGO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약 3260억원을 투자해 조직경영,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을 가르치고 있다. 티머시 제이 매클리몬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재단 이사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의 임팩트는 물론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재단의 양적 팽창을 넘어 조직 안팎에서 다양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빌게이츠재단과 록펠러재단은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NGO ‘녹색혁명동맹(AGRA)’을 공동 설립해 협력하고, 포드재단은 거액의 정책 연구 지원금을 통해 국가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한다”면서 “국내 기업재단들도 쉽고 단순한 사업만 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