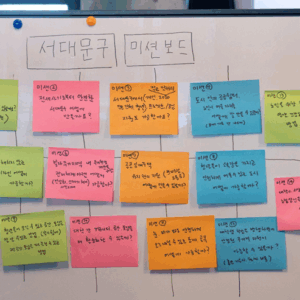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특별 기고] 인성은 한순간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 세태와 같은 입시 위주 교육 환경에서 인성 교육의 책임을 학교 현장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앞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종합적인 인성 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학교 내에서 폭력과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4년 ‘미국 학교의 개선을 위한 법(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을 제정한 이후 ‘인성 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Program)’이 승인되었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해 인성 교육을 강화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여 수준별 창의 인성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핀란드 역시 학생들이 리더십, 협동성, 책임감 등의 인성 요소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다. 모든 학생이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동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 대인관계, 자기관리, 시민의식 등 인성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내재되어 있다. 일본 또한 1998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도덕교육을 강조했고, 2009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도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 각종 매뉴얼과 지침을 제정해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연체험 등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