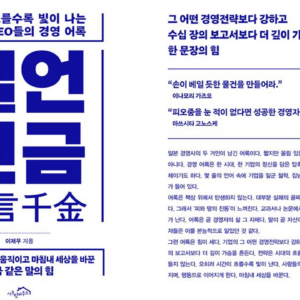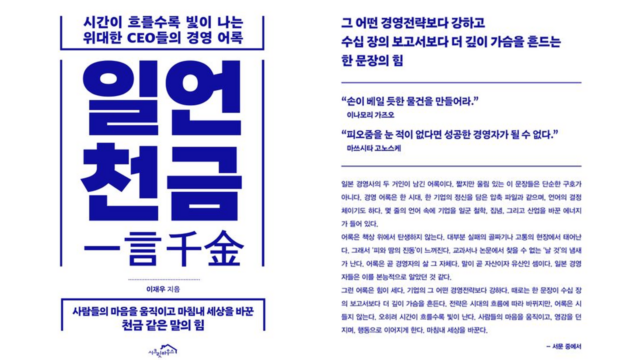‘파트너십’은 쉬운 듯 어려운 말이다. ‘서로의 이익 증대를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일 텐데 파트너십이란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지 그 앞에는 늘 수식어가 붙는다. 동등한 파트너십, 대등한 파트너십, 그리고 동반자적 파트너십까지. 모두 위계 없이 각별히 잘 지내보겠다는 뜻인데, 수사를 붙이면 붙일수록 어쩐지 더 아리송한 말이 된다. 내가 아는 가장 선명하고 쉬운 해석을 소개한다.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일한 선배가 알려준 실전형 가이드이다. 사전적 정의나 화려한 수사로 존재하는 ‘파트너십’이란 단어를 현실로 끌어내려 사고하도록 이끌어준 조언이었다. 어떤 일을 하든 아래 3가지를 기억하자 했다. 첫째, 우리는 왜 파트너와 함께 일하나? 혼자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에 함께 한다. 파트너가 내 일을 대신해줘서, 비용이 덜 들어서가 아니다. 둘째, 파트너십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내 일과 파트너 사이에 겹침이 없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만나야 한다. 셋째,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익숙하고 편한 상대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최고와 함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서로가 일의 기준을 높일때라야 점진주의를 넘어 도약한다. 일의 결과가 나아진다. 임팩트 스타트업에 합류해 7년째 일하다 보니 시나브로 실전에 뛰어든 기분이다. 학습이 어려운 아이도 성공적으로 배우도록 돕는 디지털 교육 도구를 만들어 전 세계 여러 나라, 특히 교육 격차가 큰 지역의 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닿고자 한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 현장을 지키는 파트너와 함께할때라야 가능하다. 국제기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