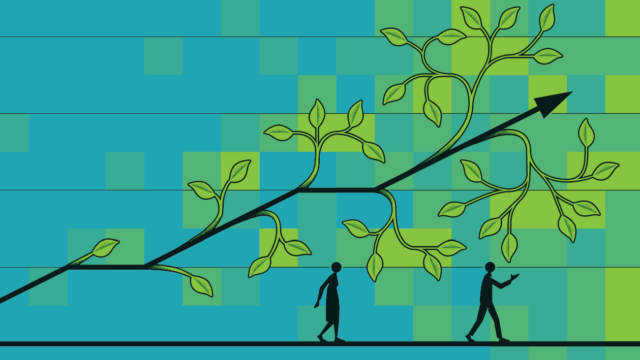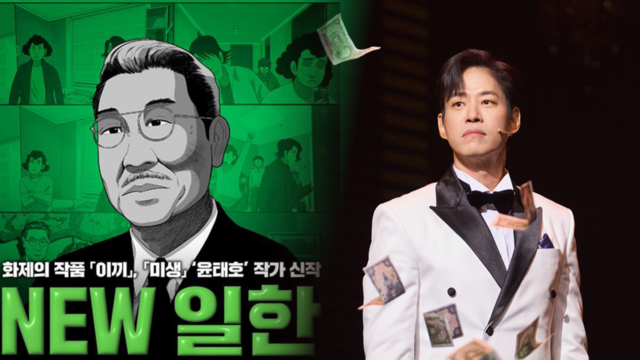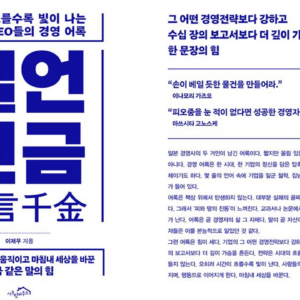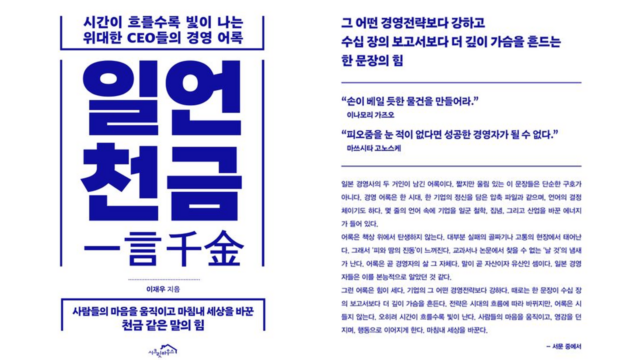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도시재생 관련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간 투자자와 호된 분쟁을 겪었다. 투자사 대표는 ‘방만 경영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회사 경영권을 요구했고, A씨는 투자자가 회사를 가로챌 목적으로 경영상 문제를 묵인하고 일을 키웠다며 맞섰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율에 나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A씨는 투자사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투자자는 경영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A씨에게 투자한 회사가 ‘임팩트투자사’라는 점이다.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도 얻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투자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A씨 사례를 “임팩트투자 과정과 결과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익률과 사회적가치 기준이 모호해 생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팩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임팩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 임팩트투자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착한 기업’이라는 마케팅 효과나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투자나 기업으로 치장하는 이른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이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은 지난 2015년 540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임팩트투자 시장을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도 속속 기금을 조성해 KB·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사가 만든 임팩트펀드 규모만 해도 수천억원대다. 10년 전만 해도 임팩트 전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 디쓰리(D3)쥬빌리, 임팩트스퀘어 등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사도 임팩트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임팩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B투자사의 ‘임팩트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성형 정보 플랫폼, e스포츠 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주체가 너도나도 임팩트투자에 나서면서 사회적가치 창출보다 투자 유치 등 ‘잿밥’에 관심이 많다고 비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임팩트투자의 진정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지난 2018년 6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투자 펀드를 내놨지만, 같은 해 9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이 펀드가 저임금 노동으로 수익을 내거나 기후 위기 연구를 방해하는 기업들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4월에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는 ▲투자 전략과 맞는 임팩트 창출 전략을 세울 것 ▲투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것 등을 포함하는 ‘임팩트투자의 9가지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임팩트투자가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초기 임팩트투자는 ‘착한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익성을 중시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젠 우리나라 소셜벤처의 역량이 올라왔으니 진정성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이 ‘수익 창출’의 기반이라는 것을 임팩트투자 스스로 증명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