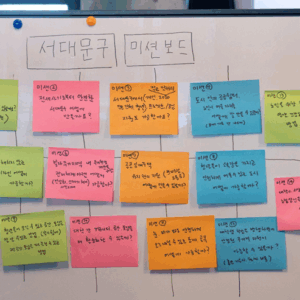유통기한의 함정
식료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기한(Sell by)’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하면 섭취가 가능해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Use by)’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 단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28%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데 쓰여
유통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각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한 후 유통 과정에서의 냉장 설비 정도 등 유통 상황을 감안해 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기한제가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권장유통기한제’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냉장 설비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우유의 경우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하면 50일 이상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10일인 현행 유통기한은 제조 이후 냉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 실제 섭취 가능 기한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
환경·소비자 단체는 유통기한제가 음식물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3년 식약처가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아이쿱생협 조합원을 중심으로 발족한 ‘소비자기후행동’은 올해 중요 어젠다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정하고 주요 해법으로 ‘소비기한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최미옥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일을 상당수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 발표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3억t에 달하고, 여기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33억t에 이른다. 전 세계 경작 가능한 농지의 28% 수준인 14억헥타르(㏊)의 땅에서 생산된 음식물이 버려진 셈이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약 26%가 음식물 쓰레기로, 연간 570만t에 달한다. 박 회장은 “이 가운데 약 10%는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된 음식으로 보인다”면서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음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 ‘소비기한’ 도입 흐름 가속화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도입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 2018년 이미 유통기한 개념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한) 등 다른 표기에 비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준다는 게 이유다.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홍콩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병기하고 중국은 소비기한과 제조일자를 병기한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일까지 섭취하면 제일 좋지만, 때때로 ○○일 이후에도 괜찮다(best before ○○, often good after ○○)”는 식의 표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한다. 국제소비자환경단체인 ‘랩(Wrap)’은 “되도록 소비기한제로 표기를 통일하되, 제조사에는 해당 식료품에 맞는 적정 보관법을 포장에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게 좋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도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에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식품 광고 및 표시법안 개정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입성조차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보건복지소위에서 최혜영(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비기한으로 변경해도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도 안전 섭취 기한의 80~90%로 책정하고, 냉장보관 등 유통상 관리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는 크지 않다”며 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농업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성명을 내어 “냉장관리·유통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못한 우리나라에선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소비기한제로 바뀌면 식품 변질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결국 소비자가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냉장 설비는 갖춰졌다지만, 과다 진열 등으로 실제 보관 온도가 낮은 등 안전상 우려가 있어 유통업계 전반의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교육과 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유통기한보다는 길지만, 소비기한도 안전 섭취 기한에 여유를 두고 정한 기준”이라며 “소비자 교육이 병행된다면 상한 식품이 유통되는 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이쿱은 “소비기한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섭취 가능 여부 판별 교육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켰다”면서 “연내에 관련 캠페인을 도입해 소비기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