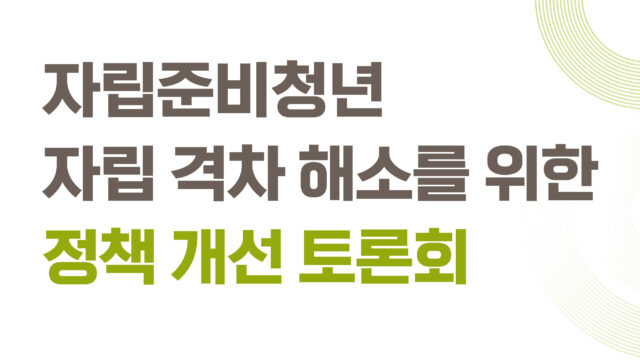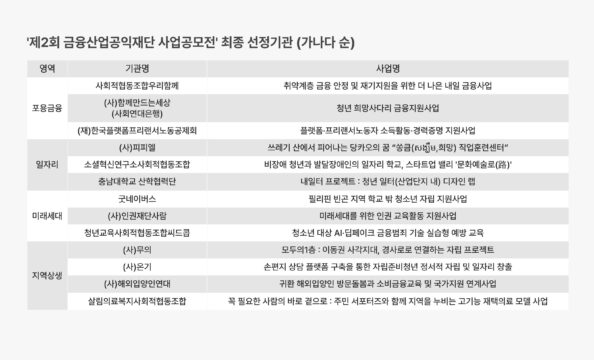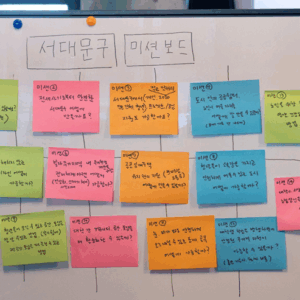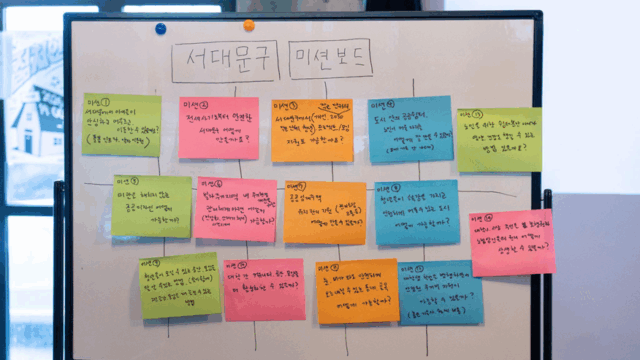양진옥 굿네이버스 신임 회장
모금에서부터 사업·기획팀까지 두루 거친 베테랑
‘사랑의 동전모으기’ 기획하고 온라인 기부 확대 이끌어
“모금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현장 사업 필수”
“저성장 시대라 위기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여전히 ‘블루오션’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사회변화를 잘 읽고 한발 더 일찍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만난 양진옥(45·사진) 신임회장의 말에는 힘이 느껴졌다. ’40대 여성 NPO 회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그녀답게, 두 시간 남짓 인터뷰 내내 ‘혁신’, ‘도전’, ‘변화’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지난달 1일, 양 회장은 이일하 전 회장의 뒤를 잇는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1995년, ‘공채 1기’로 굿네이버스에 몸담은 지 21년 만의 일이다.
토종 NPO인 굿네이버스가 설립된 지 올해로 25년. 양 회장이 쌓아 온 시간은 곧 굿네이버스의 역사가 됐다. 이일하 전 회장을 비롯, 직원 8명에 1억 남짓한 초기 기금으로 시작한 단체가, 이제는 연간 예산 1743억원(2016년 기준), 41만 명이 넘는 회원을 둔 단체로 성장했다. 국내외 지부 87곳에 사업장은 319곳에 달한다.
―맨땅에서 시작한 단체가 지난 2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회 흐름을 잘 예측했고, 변화에 준비되어 있었다. 최근에 길거리 모금이 다시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2001년 길거리 모금을 전면 중단했다. 머지않아 ‘온라인 시대’가 올 것으로 봤고, 온라인 모금으로 방향을 잡았다. 온라인 팀을 꾸려 웹진과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온라인 전용 콘텐츠도 제작했다. 5년간 반응이 없다가 2005년 네이버 해피빈 등장과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잠재력이 폭발했다. ‘백원이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후원해달라’는 ‘100원의 기적’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2006년 이후 온라인을 통한 후원자가 전체 신규 후원자의 60%를 넘어섰다. 언론 덕도 봤다. 2007년 방송 모금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나눔이 화두가 됐다. 그때 우리만큼 온라인에서 준비가 잘 갖춰져 있던 곳이 드물었다. 2008년 297억원이었던 모금액은 2013년 985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내부 조직에서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예측한다고 해도 전 직원과 공유하는 건 또 다른 과제일 것 같은데.
“굿네이버스는 설립 이래로 매년 전 직원이 3개월을 매달려 중장기 전략을 짠다. ‘3년·5년 후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 전략에 따라 내부 팀도 완전히 개편된다. 모바일이 중요하다고 예측하면, 즉시 전담 팀을 강화하는 식이다. 조직이 커지면 굳어지기 쉬운데, 우리는 전략에 따라 일 년에 두 번도 팀을 개편한다. 2008년엔 ‘굿네이버스 비전 2020’ 작업도 했다. 구체적으로 12년 후 우리 조직의 비전을 그려보는 작업이었다. 실행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전 직원과 공유했다. 굿네이버스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굴러가는 조직이다(웃음).”(그녀는 굿네이버스 전략회의가 담긴 수백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자를 책장에서 꺼내 보여주며, “이 책자가 굿네이버스 역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 양 회장은 굿네이버스의 소문난 ‘전략가’다. 21년간 모금, 사업, 기획팀을 두루 거쳤다. 전국 기업이나 상가매장 곳곳에 저금통을 설치한 ‘사랑의 굶기운동’이나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할 당시엔 굿네이버스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분석해 ‘온라인 기부자의 특성과 기부 요인, 증액 요인’등을 연구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
―21년간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어떤 업무와 고민을 거쳐 왔는지 궁금하다.
“처음 6년간 모금팀에 있다 2001년 사업팀으로 발령이 났다. 사업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돌려보니 ‘내가 그간 사업도 안 해보고 어떻게 모금을 했나’ 싶더라. 아동을 시설로 데려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소외된 아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당시 가장 큰 사각지대였던 위기가정 아동의 방학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그 이유였다. 처음엔 10개 학교를 설득했고, 수도권, 영남권 등으로 확장해 3년 이후 전국프로그램이 됐다. 꼭 필요한 사업도 적절한 기금이 있어야 확대될 수 있고, 모금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현장 사업이 필수다. 자연히 비영리조직의 경영으로 관심이 흘렀다. 2005년부터 기획실 실장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경영전략 체계를 짰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나눔사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모금방송과 기부 애플리케이션도 처음으로 시도해봤다. 2011년부터 사무총장이 되면서, 5년간 경영수업을 받았다.”
굿네이버스의 사업 기조는 ‘지역 깊숙이 들어가 소외된 아동을 발굴하는 것’. 지난 25년간 흔들린 적 없는 대원칙이다. 정부에서도 나서지 않던 시절, 국내 최초로 학대 아동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96년 민간 단체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해 성남시복지회관 내 ‘아동학대상담센터’를 만들었고,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 학대피해아동그룹홈을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한다. 양 회장은 “모금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빈곤 아동, 학대피해아동 문제를 다루다 보니 결국은 심리 정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더라. 치료사나 정신보건의와도 협력하고,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복잡하다 보니 2~3년을 고민하다 2012년 처음으로 6개 지부 ‘좋은마음센터’를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20곳으로 확대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나.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을 때다. 현장 인력은 그대로인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폭증해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 직원들이 수두룩하게 지쳐 떨어져나갔다. 그땐 매일 두통약을 달고 살았다. ‘정부는 손 놓고 있고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죽어나는데 우리가 계속해야 하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 아직 과도기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건 ‘깊이 있는 사례관리’다. 현장조사나 위기개입은 공적 영역으로 가야 한다.”
―고등학생·중학생 두 딸을 둔 ‘워킹맘’이기도 하다. 지난 21년간 일과 가정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가족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나. 나도 마찬가지였다. 실무자 때부터 워낙 주말 행사나 출장이 많았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일에도,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되더라. 나부터 내 일에 애정을 가졌고, 틈나는 대로 가족들에게 내 일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시민참여 행사 땐 가족들을 꼭 부르고, 출장 땐 어떤 업무인지를 공유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을 이해하니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을 맡아 주저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더라. 그게 21년을 지속한 힘이다.”
―모금시장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가.
“2014년까지 성장하던 추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다. 지난 2년간 세월호와 메르스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됐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개척할 영역이 크다고 본다. 현재 굿네이버스 전체 모금액의 90% 이상이 개인 정기후원자다. 고액기부, 기업기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모바일도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 담당 팀을 강화하고, 별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신임 회장으로서 앞으로 그리는 그림이 궁금하다.
“지난 20여년간 굿네이버스가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확 떨어졌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도전하는 과정은 쉽진 않았고, 새로운 시도가 빛을 보기까지 보통 5년씩은 걸렸다. 하지만 얼마만큼 미리 준비되어 있었느냐가 큰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입사했을 때를 떠올리면, 그때 꿨던 꿈 중에 이뤄진 것도 있고 아직 이뤄가는 것도 있다. 현장 활동가들, 다른 단체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