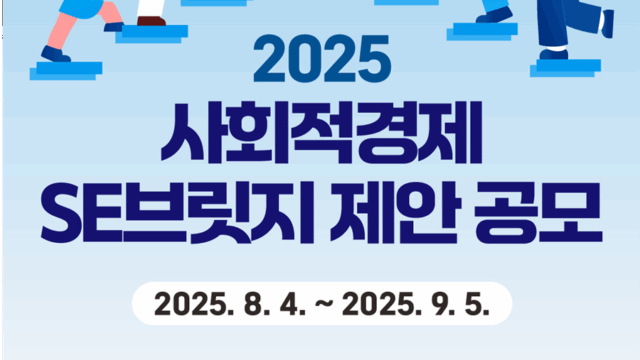[인터뷰] 책 ‘치매는 처음이지?’ 홍종석 저자(강동구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삶에 ‘치매’라는 옵션이 하나 더 붙었을 뿐, 여전히 우리 친구이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치매에 대한 공포증이 지나치게 크죠.”
치매는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운 병’으로 여긴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진단을 받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검색창에는 치매예방 건강식품 광고가 가득하고,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를 만나기까지 3~6개월이 걸린다. 진단 이후의 시간은 정보보다 혼란이 앞선다.
“부모님 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서부터 하죠?” 치매와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강동구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책을 썼다. 2010년부터 치매 현장을 지켜온 그는, 올해 6월 책 ‘치매는 처음이지?(출판사 디멘시아북스)’를 펴냈다. 치매 판정 이후 환자와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서다. 지난달 23일, 홍 복지사를 만나 치매 현장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들었다.
◇ 치매 대응, 후견 사각과 돌봄 이분법부터 바꿔야
“2010년에는 주민에게 치매 검사를 권유하면 ‘내가 치매처럼 보여요?’ 하며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홍 복지사는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변화된 인식을 실감했다고 한다. “이제는 검사를 받으러 먼저 오는 분들이 많아요. 센터 예산과 인력도 늘면서 현장 대응력도 함께 높아졌죠. 방문요양센터나 장기요양시설의 환경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앞서 한국은 2012년부터 치매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관리법’을 시행 중이다. ‘암’과 함께 병명 자체가 법률명에 명시된 드문 사례다. 그만큼 국가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현실과 간극이 있다. “일본처럼 치매 정책을 만들거나 바꿀 때 당사자나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는 아직 부족합니다. 세부 운영 방식도 손봐야 할 게 많고요.”
그는 특히 ‘후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치매 환자나 인지장애를 겪는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경제 활동이다.
“계좌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리면 계좌가 잠기고, 은행에서는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예 가족관계가 끊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아주 기본적인 금융 생활조차 막히게 됩니다.”
후견 제도는 치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지만, 현재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는 진입이 어렵다. 가정법원도 상담보다는 청구서 작성에 그친다. 그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상담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방식 역시 단순한 선택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대부분 ‘집에서 가족이 돌보거나, 아니면 시설에 보내는 것’ 둘 중 하나만 떠올립니다. 대소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시설 입소를 고민하죠.”
그는 대안으로 해외의 ‘중간집’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낙상이나 요실금 등으로 단기 재활이 필요한 고령자가 일정 기간 머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기 보호시설이다. “예전엔 한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홍 복지사는 “치매 가족 휴가제처럼, 일시적으로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와 자기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경증 치매 환자들이 더 넓은 삶의 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 환자 중에도 주식 투자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낙인이 찍힙니다. 조금 서툴고 실수하는 걸 받아줄 수 있는 사회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 치매 공존 사회는 ‘지역의 관심’에서 만들어진다
홍 복지사는 치매 환자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지역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AI나 보안업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고독사는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오늘 옆집 할머니가 안 보이면 한번 문 두드리는, 그런 관심이 해답이죠.”
한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돌본 시간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타임뱅크’ 같은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중이다. 그는 “관심을 주는 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 만큼 성과가 단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힘이 된다”며 “지역이 치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공존을 위해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도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정책을 만들 때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험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 자체가 없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정책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이에요.” 홍 복지사는 치매 당사자 단체가 꾸려진다면, 정책의 설계와 실행 모두에 생생한 현실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정책이 나와야 공감도, 실행력도 생긴다는 말이다.
그는 또 치매 진단 이후 복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짚었다. “지금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뭐가 부족한지도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요구도, 제기도 어렵죠. 일본에는 ‘케어 매니저’라는 제도가 있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설계하고 안내해줘요. 한국에도 그런 현장 전문가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보를 알리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전문가로 살고 싶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길을 현장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