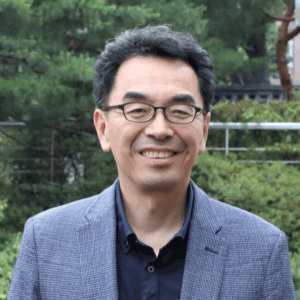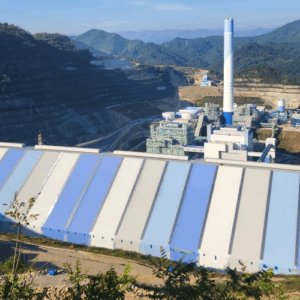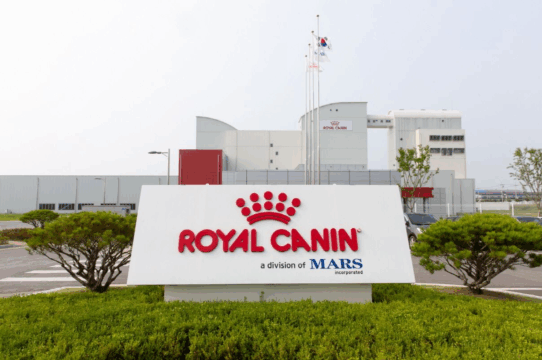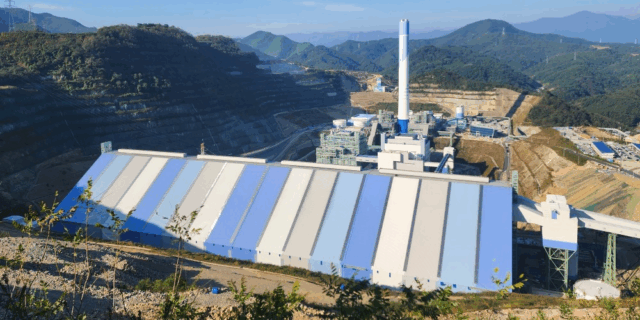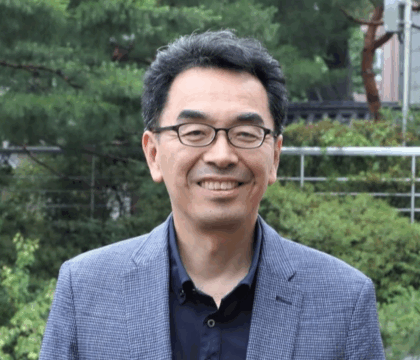시민사회·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나 인사 발령은 물론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를 공론화하고 바로잡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시민사회 대나무숲’에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페이지 운영자는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부분 ‘단체 내 부조리로 고통스럽지만 어디 말할 데가 없어 대숲을 찾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더나은미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각종 비리나 갑질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고도 공익제보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했다. 각자 속한 조직과 피해 양상은 달랐지만, 활동가들이 공론화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다.
유형1 “고발해봤자 해결 안 된다”
지난 2012년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입사 전 약속받은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곧장 부당해고에 맞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은 4년을 끌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해 법정 다툼은 2심까지 갔다. 결국 2심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및 원고 복직’ 판결을 받아내면서 싸움이 마무리됐다. 동료 노조원들이 힘을 보태준 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재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송 중에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노조원들이 ‘잘못을 바로잡아보자’며 함께 나서줬다”면서도 “결국 재판에선 이겼지만 사건의 발단인 재단의 대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노조는 해체됐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부당해고 사건의 원인을 대표의 재단 사유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영리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제대로 해결한 경험이 없다 보니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기업 직원 B씨는 지난해 경영진 중 한 명에게 성희롱·추행을 당했다. B씨는 “혐의를 입증하고 대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만 퍼질 거라고 생각해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며 “특히 비영리 내부에서는 ‘좋은 일 하는 조직 활동가는 좀 참아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은 선례도 없다”고 했다. B씨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사건을 덮었다.
유형2 “인맥으로 얽힌 비영리…찍히면 퇴출될수도”
유명 교수가 대표로 있던 한 인권단체에서 지난 2017년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은 유명세를 떨치던 교수와 관련된 사안이라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단체 활동가 중 한 명인 C씨는 “처음 조직에서 부당인사, 해고, 갑질 문제가 불거진 건 2014년”이라면서 “당시 활동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려 했지만 이사진들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유로 공론화를 꺼렸다”고 했다. 그는 “외부에 알려봤자 우리만 다칠 것 같아서 걱정도 됐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외부에 꺼냈다”고 했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는 전·현직 직원들이 단체장의 기부금 부정 사용 내역과 부당해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공익제보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현재 누구 하나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 단체 퇴사자인 D씨는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체장이 유명 기업가에게 통 큰 기부를 받을 정도로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 제보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 지방 소도시의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E씨는 “지역 시민사회는 인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쁜 소문이 돌면 ‘끝'”이라며 “공익제보자는 손가락질당하고 낙인찍히는 일도 많다”고 했다. 그는 “재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하려면 아예 지역을 떠날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유형3 “부정적 이슈로 비영리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던 E씨는 단체장의 부당 업무 지시와 언어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단체를 떠났다. 제보도 고민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내는 걸로 결론지었다. 고압적인 단체장은 밉지만,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돕던 지역 주민들도 걱정됐다. 그는 “특정 단체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비영리 전체를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니 공론화가 꺼려진다”며 “나 하나만 참으면 마을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종교 기반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F씨는 상사의 상습적인 야근 강요, 개인 업무 지시, 폭언 등에 시달려야 했다. “‘확 고소할까’ 했지만, 단체 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지역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참았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서 갑질 문제가 터지면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비영리단체는 전체가 다 ‘도둑놈’인 것처럼 매도된다”며 “재직 당시 전혀 관련 없는 기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도 우리 기관까지 기부 해지 문의가 빗발쳤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가 비영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자정작용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비영리 투명성 측정의 잣대로 보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체가 내부 비위를 스스로 적발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비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비난받고 제보자는 보호도 받을 수 없으니 공익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노조 설립에 참여했던 한 활동가는 “비영리나 시민사회에서 특별히 부조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