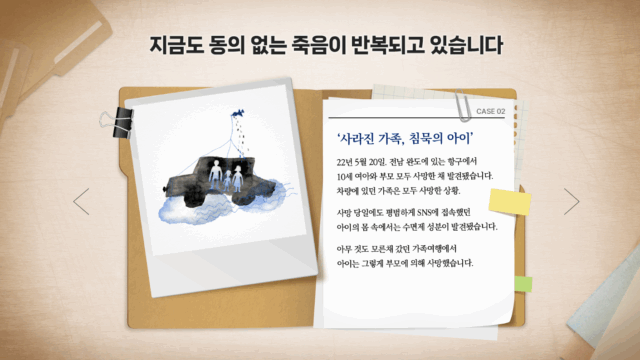부산 유일 장애인 야학 사라질 위기

지난 8일 부산진구의 ‘장애인참배움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삿짐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들이었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자들은 천장에 닿을 듯 높게 쌓였고, 서랍장과 책장은 검은 천으로 덮였다. 실내 공간 한복판을 차지한 화이트보드와 책걸상만이 제자리인 것처럼 정돈돼 있었다. 참배움터는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야간 학교다. 성인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나 한글 등을 교육한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수선한데….” 유재윤 사무국장이 머쓱해하며 말했다.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했는데, 코로나 이후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공간 유지조차 어렵다”고 했다.
부산 유일의 장애인 야학인 장애인참배움터가 사라질 위기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평이 넘는 공간에 있었던 학교는 지난 8월 쫓기듯 현재 30평 남짓한 사무실로 이사 왔다. 매달 빠져나가는 임차료부터 줄이기 위해서였다. 상근 교사들은 9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일부 교사는 부업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난 사람도 있다. 야학을 찾던 학생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참배움터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건 지난 3월부터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수업도 중단된 그 시기다. 장애인 야학은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수업을 열지 않으면 보조금을 어디에도 쓸 수 없게 된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야학은 단순 기관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유재윤 사무국장은 “지난 몇 년간 모아 뒀던 후원금과 교사들의 사비로 9개월을 버텼지만, 이제 한계”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되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애인 야학은 중증 장애 성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자 1980년대 초 시작된 민간 교육 시설이다. 당시에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꽤 있었지만, 인지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설은 없었다. 게다가 중증 장애인들은 일반 학교에 입학하려 해도 거부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국내 첫 장애인 야학은 1981년 인천에서 설립된 ‘작은자야학’이다. 이후 전국에 하나둘 장애인 야학이 생겨나기 시작해 지금은 총 61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증 장애 성인들에게 장애인 야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김삼섭 중부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은 “장애인 야학은 집에 갇혀 있던 중증 장애 성인들이 사람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참여의 발판이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참배움터 학생인 최수영(47)씨는 장애인 야학에 다니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선천성 뇌병변으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 그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힘겨웠다. 당시 교장이 입학을 거부했고, 부친이 교장을 찾아가 사정사정한 끝에 겨우 승낙을 받아냈다. 거기까지였다. 중학교는 가지 않았다. 당시 부모님도 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최씨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 그 후, 최씨는 ‘편하지 못한’ 25년을 집에서 보냈다. 그는 “집에서 나가질 못하니 가족들과 갈등만 쌓여갔고 모두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씨가 참배움터에 다니기 시작한 건 2012년이었다. 그는 “처음 만난 유 국장한테 ‘나 같은 중증 장애인은 학력 있어도 취직 못 한다’고 역정을 냈었는데, 검정고시로 1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땄다”면서 웃었다. 야학에 다니면서 성격도 부드럽게 바뀌었다. 최씨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졸업장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자신감을 키우고 삶을 바꾸는 존재”라고 말했다. 권은미 참배움터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한 지체장애인 학생은 야학에 다니고 나서 ‘더 살고 싶어졌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면서 “중증 장애 성인들에게 장애인 야학은 학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증 장애인들이 느끼는 장애인 야학의 필요성에 비해 공공 부문의 지원은 미비하다. 지난 10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내놓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 성인 1인당 교육 예산액은 평균 2161원이다. 반면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의 1인당 교육 예산액은 평균 3395만원이다. 장애 성인 교육 예산이 특수교육 예산의 0.0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작은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 책정 기준이다. 장애인 야학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말 시·도교육청에 다음 해 교육 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야학의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따져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이때 교육청이 얼마를 책정할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장애인 야학의 보조금 규모를 책정하는 별도 기준은 없다”고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장애인 야학이 거의 없고 딱히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야학 관계자들은 보조금이 부족해도 항의조차 못한다. 김진수 김포장애인야학 교장은 “현재 수준의 보조금으로는 임차료와 교사 2명 인건비로 쓰면 끝”이라며 “교육청에 사정을 말해도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황보경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돈이 더 필요하면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돈을 끌어모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김삼섭 원장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지침을 만들어 장애 성인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