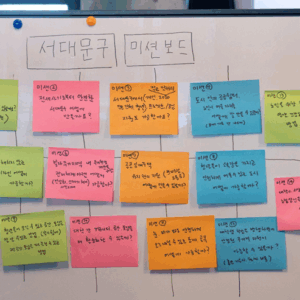꼭 입양돼야 하는 아이라면 외국보다 한국 가정 먼저 고려해줬으면
진짜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시선
정체성 문제로부터만 자유로울 수 있어도 아이들은 훨씬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

다섯 살 때 한국을 등졌던 아이는 마흔네 살이 되어 돌아왔다. 원망하기도, 그리워하기도 했던 조국이다. 1971년 벨기에로 입양돼, 지금은 세계적인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융 에낭’(Jung Henin·한국명 전정식·1965년생 추정)씨 얘기다. 자라는 내내 ‘날 벨기에인으로 볼까’라며 맘 졸였던 융 감독. 한국에 와선 ‘날 한국인으로 볼까’라는 걱정을 한다. 지난 8일 국내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피부색깔=꿀색’은 그런 그의 삶을 꾹꾹 눌러 담은 이야기다. ‘피부색깔=꿀색’이란 제목은 입양 당시 서류에서 융 감독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기록에서 따왔다. 영화의 울림은 컸다. 80여개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으며 상을 23개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뉴욕에서 ‘UN특별상영’이 진행되기도 했다. 영화 홍보차 생애 세 번째 모국을 찾은 융 감독을 직접 만나 영화가 된 삶을 들어봤다(융 감독은 2010년 8월 이번 영화의 촬영을 위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고, 2013년 11월 부천애니메이션영화제 개막작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영화를 보니, 입양돼 살았던 벨기에 마을에 아시아계 아이들이 많던데, 어떤 환경이었나.
“우리 마을은 수도 ‘브뤼셀’에서 25㎞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비교적 부유한 마을이었다. 가난한 한국의 아이를 입양하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영화에서는 ‘새 차를 사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됐다). 내가 입양될 때 나와 함께 이 마을로 온 한국 아이들이 10명 정도였다. 한국전쟁 이후 아이 약 20만명이 전 세계로 보내졌는데, 벨기에 전체로 보면 한국 아이가 약 3000명 있었고, 프랑스에는 1만5000명이나 됐다. 내게 한국은 ‘애들을 버리는 나라’였다.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고, 마을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것도 괴로웠다. 잊고 싶은 ‘뿌리’를 떠올리게 됐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아시아계 아이를 마주치면 딴 길로 돌아가기도 했고, 일본인인 양 행동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서양을 이기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기 때문이다.”(영화 속에서 어린 융은 늘 ‘TOKYO’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나온다.)
―버려졌다는 슬픔과 이방인으로서의 혼란이 영화를 가득 채운다. 따뜻한 부모·형제로 이뤄진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는데도 말이다.
“난 입양 전 기억이 거의 없었다. 나중에 기록을 보고 서울의 한 시장에서 경찰에게 발견돼 ‘홀트아동복지회’로 옮겨졌다는 걸 알았다. 당시 살았던 고아원 분위기, 프랑스어를 배우며 잊어갔던 모국어에 대한 기억만 어렴풋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내가 입양된 가정엔 이미 친자녀가 넷 있었다. 큰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화목했고, 형제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일곱 살 무렵부터 내가 다르다는 걸 의식했다. 거울을 보고, ‘난 왜 형·동생처럼 금발에 푸른 눈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 그때부터 엄청난 공허감에 시달렸다. 떼려고 해도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부모님이 날 버렸을까’ ‘내가 못된 아이라서 버렸을까’ 따위의 생각들이다. 많은 입양아가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가 ‘사랑의 결실’이었는지, ‘사고의 결과물’인지도 궁금해한다. 이런 물음에 사로잡혀 대부분 평생을 우울하게 보낸다. 심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영화에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미셸’이나, 약물을 과다 복용한 ‘안느’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 입양인 친구들도 등장한다. 25세 때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생 ‘발레리’도 그 중 하나다.)
―숱한 위기와 마음고생을 겪고도 잘 극복해냈는데, 비결이 무엇이었나.(융 감독은 프랑스 문화권을 중심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한 판타지 애니메이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정체성 갈등을 겪은 후 이 ‘트라우마’는 온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난 장애아와 입양아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이를 극복하고 뛰어다닐 수는 없다. 받아들이고, 다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입양아도 마찬가지다. ‘나는 희생자야’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버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난 두 가지 행운이 더해졌다. 하나는 가족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그림이었다. 양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면 아픔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그랬다. 또 그림은 내게 좋은 치료요법이자 피난처가 돼줬다. 친어머니 같은 존재를 종이 위에 맘껏 창조해가며 그 사랑 안에서 있을 수 있었고, 맘에 안 드는 건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융 감독은 입양아가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기회는 마치 ‘복권’을 긁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영화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에게 빚이 있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인가.
“나는 입양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해외 입양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한국은 세계에서 여섯째로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국가이며, 지난 60년 동안 누적 입양아 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 했던 시절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됐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가 외국으로 보내졌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꼭 입양돼야 하는 아이라면 외국보다 한국 가정을 먼저 고려해줬으면 한다. 정체성 문제로부터만 자유로울 수 있어도 아이들은 훨씬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2012년 국내에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가 쉬워지고, 좀 더 체계적이며 신중하게 입양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을 알고 있나.
“특례법에 대해선 알고 있다. 절차가 복잡해지며 아이를 박스에 싸서 버리는 일도 늘고 있다고 들었다. ‘베이비박스’ 현장도 직접 보고 왔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의식이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도,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다. 아이가 걸림돌이 되니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상적인 사회로 보이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전혀 나쁘지 않다. 어떤 사회 구성원도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재구성 가정’이라 하여, 아이를 데리고 새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자유롭다. 물론 유럽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한국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아침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들었는데, 친부모를 찾을 마음이 있는가.
“친엄마를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지난 ’98프랑스월드컵’ 때 한국과 벨기에가 맞붙었다. 당시 누굴 응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이 골을 넣으니 기쁘고, 벨기에가 골을 넣어도 기쁘더라. 누가 이기든지 좋은 게 지금의 나다(공교롭게도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도 한국은 벨기에와 만난다). 아침 방송은 그저 영화와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딱히 ‘뿌리 찾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입양 서류에 아무런 단서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어려서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큰 상처를 겪어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과정을 겪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친부모님들이 내 영화를 보고 찾아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면, 물론 그건 내게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융 감독은 영화 마지막 멘트에 “엄마, 혹시 보게 되면 원망 안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죄책감에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평생 내 걱정하며 사시겠죠”라고 남겼다.)